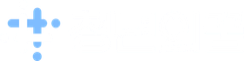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 담은 ‘칼’럼
‘과거 앙숙’ 英‧튀르키예, 갈리폴리전투 공동추모
‘과거 앙숙’ 韓日, 과거 기억하되 공존 모색하길
“이가 갈리폴리”
“나는 지금 귀관들에게 싸울 것을 명령하는 게 아니다. 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그들은 불구자‧부상자‧장애인들 모아 배에 실어 집으로 돌려보냈다네. 팔 없는 자들, 다리 없는 자들, 장님들, 미쳐버린 사람들을”
전자(前者)는 튀르키예 민족영웅 케말 파샤(Kemal Pasha)가 한 말이다. 후자(後者)는 영국 출신의 호주 포크가수 에릭 보글(Eric Bogle)의 1971년 곡 ‘그리고 밴드는 왈칭 마틸다(Waltzing Matilda)를 연주했다’ 가사다.
이 둘은 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 있다. 바로 “이가 갈리폴리”라 불리던 1915년 4월25일~1916년 1월9일의 갈리폴리 전투(Gallipoli campaign)다.
해당 전역(戰役)에선 영국‧안작(Anzac‧호주 및 뉴질랜드)‧프랑스 등 연합군과 오스만(튀르키예)‧독일이 맞붙었다. 얼마나 처참한 전투였냐면 거두절미하고 사상자는 도합 50만명에 이르렀다. 서로에 대한 증오도 극에 달했다. 한 안작 측 참전용사는 “우리가 얼마나 새X(Bastard)라는 욕을 많이 했는지 한 오스만 포로는 새X가 우리들이 믿는 신(神)인 줄 알더라” 회고(回顧)했다.
폭발한 감정
갈리폴리 전투 배경엔 대영제국‧러시아제국이 유라시아 패권 다툰 1813~1907년의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이 있다. 당초 오스만제국은 중립으로서 영국‧프랑스에게선 차관(借款)을, 독일에게선 군사고문단을 지원받는 등 실리외교 펼쳤다.
허나 1907년 대영제국‧러시아제국이 돌연 화해하고 독일을 공동견제하면서 오스만 측 외교기조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1914년 양 제국과 프랑스는 사라예보 사건(Assassination of Archduke Franz Ferdinand)을 이유로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제1차 세계대전 일으켰다.
오스만은 영국 대신 독일 측 손을 들어줬다. 설상가상 영불발(發) 러시아행(行) 해상로에 있어서 지중해 통한 흑해항로 즉 오스만 안방을 경유하는 길이 사실상 유일하게 되자, 오스만은 무늬만 중립국인 척 선언하고서 해로(海路)를 막아버렸다. 그 시절엔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없었다. 러시아는 고립되다시피 했다.
이를 틈타 독일은 오스만 수도 콘스탄티니예(Konstantiniyye‧현 이스탄불) 항구에 두 척의 전함 기항시켰다. 오스만은 “독일 함포가 우릴 겨누고 있어서 하는 수 없이 쟤들 편들어야겠어요” 능청 떨었다. 결국 독일은 1914년 10월29일 자국 전함은 물론 ‘오스만 군함’까지 이끌고서 흑해의 러시아 군항(軍港) 포격했다.
전통적으로 사방이 잠재적 적국이었던 독일은 전격전(電擊戰)이 기본교리다. 러시아라는 ‘곰탱이’ 잡아먹은 독일은 체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영불을 칠 게 뻔했다. 안 그래도 그레이트 게임 와중에 문어발외교로 단물만 빨아먹은 오스만 곱게 보지 않던 영국은 폭발했다.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당시 영국 해군장관은 대함대로 다르다넬스 해협(Dardanelles Str.) 장악한 뒤 해군육전대(해병대)로 콘스탄티니예를 밀어버리겠다 별렀다. 바야흐로 영국 등 56만, 튀르키예 등 31만 대군 동원된 갈리폴리 전투의 서막(序幕)이었다.
아라리난장
왕년의 전설적 헤비급 복서 마이크 타이슨(Mike Tyson)이 했다는 말 있다.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은 있다. X 맞기 전까지는”
여느 20세기 초 정치인‧고급장교들이 다 그랬듯 처칠 등도 다르다넬스 해협이라곤 근처에도 가본 적 없었다. 작전은 지도만 보고 세웠다. 때문에 이곳이 얼마나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사지(死地)인지 꿈에도 몰랐다.
해당 해협은 길이는 61㎞에 달하지만 폭은 최대 6㎞, 최저 1㎞에 불과하다. 자연히 대함대가 한 번 진입하면 출구로 빠져나갈 때까지 ‘빠꾸’는 불가능하다. 유턴도 못한 채 오리배처럼 떠내려가는 영국함대 기다리는 건 일렬로 늘어선 약 100문의 오스만 해안포(海岸砲)들이었다.
오스만은 영국함대를 레프트 스트레이트 훅으로 신나게 두들겨 패 인간샌드백으로 만들겠다 자신했다. 그런데 유유상종(類類相從)‧덤앤더머랄까, 오스만은 자신들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가랏” 외침과 함께 맹렬히 날아간 포탄 상당수는 영국군만 골라 기적적으로 비켜가며 꽈배기 궤적으로 착탄했다. 그리곤 착한 물고기들만 집단학살해 해양생태학자‧동물보호단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아무도 죽지 않는 밤낮 포격전에 인근 주민들만 박수치며 공짜 불꽃쇼 구경했다.
영국군에 피해준 건 도리어 독일 측 도움으로 사전 부설한 기뢰(機雷)들이었다. 영국도 기뢰존재를 미리 알고서 대비했다. 허나 “늬들이 다이빙해서 저 폭탄 치우렴” 동원한 인력은 쭈꾸미나 때려잡던 ‘민간 어부들’이었다. 당연히 이들은 포성(砲聲) 들림과 동시에 음속으로 도주했다. 게다가 천신만고 끝에 뭍에 도착한 뒤 상륙할 해병대를 까먹고 안 데려온 걸 영국군은 깨달았다. 실로 총체적 난국, 돈 주고도 못 볼 아라리난장쇼였다.
지옥의 묵시록
처칠이 잘리고, 일선 사령관도 잘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사이 오스만은 정신 차리고 병력 재정비에 성공했다. 어쨌거나 다르다넬스 해전에서 상륙거점 확보라는 전략목표 달성엔 성공한 영국군은 함포로 맞사격하면서 본국(本國)에 전화해 해병대 호출했다.
진짜 고생길은 이제 시작이었다. 영국군 상륙지점은 승‧하선 간편한 항구가 아닌 삼면이 가파른 고지대로 둘러싸인 좁디좁은 해안가 등이었다. 능선(稜線)에 이미 화망(火網) 구축했던 오스만군은 좁은 곳에 갇혀 저희끼리 밟고 밟히는 영국군 내려다보며 총탄 갈겼다. 영국군 상당수는 칠면조사냥 당하듯 터키슛(Turkey shoot)에 노출됐다. 에릭 보글의 노래처럼 많은 이로부터 피가 쏟아졌다.
참다못한 영국은 함포로 오스만 진지 정리하면서 산등성이 기어오른다는 계획 입안했다. 함포가 진지 때려 오스만군이 정신 못 차릴 때 그나마 사지 멀쩡한 호주군이 등산해 백병전(白兵戰) 벌인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육해군 사령관 시계 시‧분침이 따로 놀았다. 때문에 지상군이 한창 절벽 매달려 오를 때 포탄비가 뚝 그쳤다. 다시금 총포 겨눈 오스만군은 상당히 짧아진 사거리에서 호주군의 생생한 얼굴표정 확인하며 학살했다. 호주군으로선 응사(應射) 위해 집총(執銃)했다간 그대로 절벽 아래 추락이기에 눈 뜬 채로 당했다.
이 돌격에서만 약 8000명이 전사하고 약 2만명이 중경상 입었다. 전투 내내 누적된 오스만 측 피해도 만만찮았다. 갈리폴리 전투는 오스만의 상처뿐인 승리로 끝났다.
영국군 구출한 오스만 병사
글 분위기가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 본 칼럼에 다소 위트를 가미했지만 실상 전쟁만큼 비극적인 건 없다.
뒤로는 바다, 앞으론 절벽인 분지(盆地)에 갇혀 파리떼처럼 죽어갔을 영국군 등 심정은 안 봐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이들을 도륙하면서 “나는 과연 군인인가 살인마인가” 죄책감 시달렸을 오스만군 심정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도합 수십만에 이르는 부상자들 울부짖음‧절규에 귀 틀어막았을 영국‧오스만군 눈물은 인간이라면 천번만번 공감할 수 있다.
끔찍한 역사이지만 성형수술 기원(起源)은 전쟁이다. 인류는 1차 세계대전에서 그 이전엔 목격하지 못한 대량살상 목도했다. 기관총‧참호‧철조망으로 돌격한 병사들은 총포에 맞아 얼굴 절반이 사라지는 등 처참한 부상 입었다. 생리대도 마찬가지다. 야전병원(野戰病院)은 사지가 찢겨나간 부상자들 선혈로 하천 이뤘다. 감당 안 된 의료진은 목화 대신 전용흡수지로 지혈(止血)했다. 24시간 환자들 돌봐야 했던 여성간호사들은 급한 대로 이 흡수지로 생리대 만들어 썼다고 한다.
이러한 참상 때문인지 야수성(野獸性)만 난무하던 갈리폴리 전장(戰場) 한복판에서도 일말의 인간성은 피어났다.
매 접전이 끝난 뒤 영국‧오스만 진영 사이 무인지대(無人地帶)는 시체‧부상병으로 뒤덮였다. 무인지대에 뛰어들었다간 대번에 시신 하나 추가이기에 누구도 부상자 구할 엄두 못 냈다. 그런데 인간의 그것이라기보다는 짐승의 그것과 가까운 단말마(斷末摩)의 울부짖음 듣다 못한 한 오스만 병사가 무인지대로 뛰어갔다. 그리곤 해당 비명 내지르던 영국 초급장교 번쩍 안아다 영국군 진지에 내던지고선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참호로 돌아갔다. 누구도 이들을 쏘지 않았다.
오늘날 영국‧튀르키예 국민은 매년 4월25일의 안작데이(Anzac Day) 등 각종 행사에서 약 100년 전 산화(散花)한 양국 장병들을 ‘공동추모’한다. 그곳에선 누가 옳네 누가 그르네 언쟁은 없다. 오로지 각자의 모국(母國) 위해 목숨 바친 이들에 대한 추념, 적대감 속에서도 인도주의를 실천한 상대에 대한 감사만이 있다.
전쟁이 발발한 이스라엘에서 한일(韓日) 국민들 구조한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21일 도쿄(東京)에 도착했다. 앞서 한국군 또한 우리 국민은 물론 일본인들도 구출한 바 있다.
한일은 비록 약 반세기 전엔 앙숙이었으나 오늘날엔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의 길을 모색 중이다. 한일은 좋은 싫든 이웃이다. 양 국 주변엔 중국‧러시아‧북한 등 제국주의‧폭력주의 판치고 있다. 한일은 마치 영국‧튀르키예처럼 과거는 잊지 않되 맹목적 상호적대는 지양(止揚)하는 관계 되길 염원한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