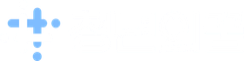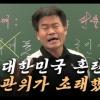|
전통주의 의미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전통주 판매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간’을 외면하며 실타래가 더욱 엉키고 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전통주가 오랜 시간 내려온 방법과 재료로 빚어진 술이 아닌, 와인이나 하이볼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산업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그간 주류제조면허 주종은 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 등 발효주로만 제한됐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95%로 낮췄다.
문제는 지역특산주의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이다. 현재 상위 3개 원료의 경우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하는데 이 요건을 95%로 낮춘 것. 이미 지역특산주는 전통주 면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인해 난립하는 주종들은 전통주의 의미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무척 높다.
일반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떠올리는 전통주는, 오래 전부터 계승되어오는 방식을 통해 빚어낸 말 그대로 전통적인 술이다. 잘 알려진 ‘문배주’나 ‘안동소주’, ‘오메기술’ 등이다.
다만 주세법상 구분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인식은 흐려진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와인, 브랜디, 위스키, 하이볼 등도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전통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구분된다. 일반 국민들이 떠올리는, 전통 방식으로 빚어내는 전통주는 바로 민속주다.
민속주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식품명인만 취득이 가능하다. 전통주 부문 무형문화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양조장은 불과 30여곳에 불과하다.
식품명인 역시 관련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전통 조리방법을 예로부터 내려온 원형 그대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식품명인 허가를 받은 명인으로부터 관련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아야 비로소 민속주 면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지역특산주는 지역 농산물만 이용하면 된다. 소규모 양조장에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추천서만 받으면 돼 진입 장벽이 압도적으로 낮다. 3~4년 된 양조장도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다.
조주 방식과 상관 없다보니 와인, 사이다, 브랜디 등도 전통주로 편입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주 면허의 97%가 지역특산주인 이유기도 하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3년 48개였던 민속주 면허는 2023년 46개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지역특산주 면허는 654개에서 1766개로 1000여개 이상 폭등했다. 불과 10년만에 벌어진 일이다. 와인, 브랜디, 하이볼 등이 포함되는 과실주·리큐르·기타주류 면허 수는 504개로 이는 탁주(359)나 약주(368)보다 많다.
소규모 양조장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되,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분리해 육성하자는 의견은 수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통주를 육성하고 판로를 넓혀주자는 의미는 좋지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뿌리를 솎아내는 행위에 그친다.
국가가 보호하고, 장려하고, 계승해야 하는 술은 민속주다. 언제부터 와인이 전통주였을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3/20250213001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