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제도와 권력은 정당성(합법성·Legitimacy)과 안정성 두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한다. 그래야 국가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언제나 출렁거리기 마련이다.
오늘날, 그리고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없이 레지티머시를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주어졌다고 하루아침에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리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1948년 건국 이후부터며,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라면 이제 34세다. 그 30여 년, 나름 의미 있게 시작됐다 여겼지만 온갖 우여곡절(迂餘曲折)과 파행(跛行)의 얼룩 또한 적지 않다.
한편으로는 민주화의 그늘에서 이 자유민주 체제 자체를 유린하려는 독초(毒草)가 자라났고, 또 한편으로는 건달도 못 되는 ‘정치 양아치’들이 민주를 빙자해 활개 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틀을 갖추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조잡함과 저열(低劣)함으로 가득 차 있는 ‘양아치 데모크라시’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신사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 정치인의 저열함 탓일까 아니면 국민들의 수준 탓일까?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프랑스의 보수주의 정치사상가 조제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 1753~1821)가 1811년 한 말이다. 메스트르는 프랑스혁명에 반대하고 군주정(君主政)을 옹호한 사람이다. 때문에 오늘날의 민주정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인용할 만하진 않다.
그러나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뼈를 때리는 힐난으로 다가온다.
지금의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그리고 혹여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이재명 정부는 어떤 것일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를 겪고 있는데 그보다 더한 희대(稀代)의 엽기적(獵奇的) 정치의 도래(到來)가 어른거린다고 하면 지나친 얘기인가?
단순히 법률 제정만이 아니라 정치 자체가 좀 그렇다. 국민을 위한다며 갖은 명분을 내걸고 심지어 정의(正義)를 앞세우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토가 나오게’ 만들곤 한다. 철혈재상(鐵血宰相)이라 불리던 비스마르크조차 한마디를 남길 만큼이다.
대장동 게이트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등장하는 이름마저 매우 중국스럽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다. 대법관 출신까지 등장한다.
그 외에도 온갖 인물이 거론된다. 가히 ‘아수라’의 경지다. 단순히 지저분하다거나 부정부패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냥 일탈(逸脫)이 아니다. 조직적인 범죄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수라 범죄의 궁극적 책임자로 지목되는 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우겨댄다. 급기야 여당의 대선(大選)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다. 물론 마지막 경선(競選)에서는 62.37% 대 28.30%로 대패(大敗)를 했다. 정상적인 여론이 반영된 상식적인 결과다.
그런데 기괴한 여론조사 결과가 뒤따랐다. ‘대장동 의혹’에 ‘이재명(李在明)의 책임이 56.5%, 국민의힘 책임이 34.2%’라는 것이다. 사업의 최종결재권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추진한 최대 업적이라며 자랑까지 했던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비록(?) 34.2%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 책임이 있다는 여론 수치의 의미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국민의힘 쪽 한 인물의 관련이 불거지긴 했다. 하지만 그것은 연결된 부패이지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가 강변했던 논리대로 국민의힘 쪽에 책임이 있다는 데 동조하는 여론 수치가 나왔다. 그들은 진짜로 그렇게 여기는 것일까 아니면 우기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정상이 아니다.
오늘날, 그리고 우리의 경우도 그렇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19세기 ‘비스마르크의 소시지’보다 더하다. 차라리 소시지는 약과다. 굳이 비유하자면 ‘중국산 김치’ 제조 공정이랄까.
오늘날 소시지 제조 과정은 더 이상 비스마르크가 빗댄 소시지 제조 과정 같지는 않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에 대해선 아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거의 그런 꼴이다정치와 정치가에 대해 이상적인 수준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사실 정치는 그 함의(含意) 자체가 이상(理想)이기보다는 현실의 문제다. 물론 서구 정치철학의 원점에 해당하는 플라톤의 경우에서 보자면 정치라는 게 이상적 차원에서 다뤄지긴 했다.
하지만 사실은 플라톤조차도 이상적 정치를 논하기는 했지만 그 현실적 실현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오해와는 다른 논지도 제시했다. 이점에 대해선 후술(後述)하기로 하고 우선 보다 현대에 가까운 근대 민주정치의 선구자의 말을 들어보자.
“만약 인간이 천사(天使)라면 정부는 불필요할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매디슨이 《연방주의자 논고》에서 언급한 얘기다.
정치 자체가 그렇다. 정치는 천사들의 대화가 아니다. 정치는 전혀 천사일 수 없는 욕망을 가진 인간들끼리의 것이다. 현실의 인간은 불가피한 욕망의 범벅이다. 생존을 위하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인간은 분투를 하게 된다. 그 같은 분투는 결코 악(惡)이 아니다. 그러나 타자(他者)와의 관계에 놓이게 될 때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바로 거기에 정치가 있다.
절대적으로 고립돼 있는 ‘나 홀로’의 개인이라면 타자와의 관계도 갈등도 없다. 그러나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 자체가 타자를 전제한다. 자신을 의식하는 것과 타자를 인식하는 것은 동일한 의식의 양면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다. 갈등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게 정치다.그러나 정치적 현실성이라는 게 악(惡)을 용인하는 것일 수는 없다. 정치는 그 자체로 이상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어선 안 되지만 명백한 악에 대해선 맞서야 한다. 이 같은 관점은 플라톤주의자임과 동시에 기독교 교부(敎父)철학의 원점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지에선 매우 중요하게 짚어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자이지만 그의 신학(神學)은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정치철학적 고찰도 담고 있다. 그는 인간을 한계를 가진 존재로 보고 그 한계의 존재에 의한 ‘지상의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 지향의 포기를 말하는 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계를 말함과 동시에 올바름의 추구를 말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친구들과 함께 과수원에서 배를 훔친 경험을 회고한다. 그는 몇 개 먹지도 않고 돼지에게 던져주면 어떨까 얘기했다고 하며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단지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을 즐겼을 뿐이라고 고백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체가 아닌 정신에서 악행이 나왔음을 깨달았다. ‘철인왕’이라고 해서 그런 한계가 없을 것인가?
인간의 근본적인 이런 한계를 도외시한 이상 국가 혹은 이상적 정치에 대한 집착은 착오와 극단주의를 부르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올바름의 추구가 포기돼도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철인왕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올바름을 지키는 책임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지상의 나라’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이 그러하다.
현실은 헤아려야 하는 것이지 핑계가 돼선 안 된다. 현실이 핑계가 되어 올바름의 가치를 놓아버리게 되면 가치부재(價値不在)의 정치가 된다. 현대 리버럴 정치는 상대주의적(相對主義的) 경향이 심화되면서 가치부재로 치달았다. 상대주의에 따른 가치판단의 포기가 되레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으로 행세했다. 그 결과 지금 서구문명은 가치붕괴의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우파(右派) 진영은 실용주의(實用主義)와 중도론(中道論)에 몰두했다. 가치지향의 포기였다. 이 같은 포기는 좌익(左翼)의 몰(沒)가치성과 폭주(暴走)에 단호히 맞서지 못하게 했다. 무원칙하게 타협적인 정치공학으로 확장을 꾀했다. 그러나 그 같은 가치부재의 정치는 설득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뿐이었다.
독선(獨善)은 언제나 위험하다.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아예 놓아버리면 무기력하게 된다. 교만과 독선은 언제나 위험하다. 하지만 상대주의와 실용주의적 태도로 가치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에 빠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허약하게 만든다. 가치부재의 기능주의적(機能主義的) 정치는 결국 힘도 잃는다. 정당성의 주장을 포기한 정치는 결국 그 반대편의 독선적 주장으로 무장한 정치에 무력(無力)하게 된다.
그런 무기력함이 정치타락을 극한으로 치닫게 했다. 패거리 범죄집단이 정치로 치장하여 나설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범죄적 정치 패거리들에 선동된 ‘르상티망(원한)’적 ‘한(恨)의 정치’의 감성이 무리를 이루면서 최소한의 시민적 양식(良識)조차 집어삼키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이 계속되면 민주주의는 물론 정치 자체가 파멸로 치닫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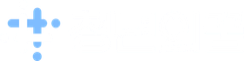





















맞는 말이오만, 그렇다고 가르쳐들려고 해도 안 됨. 결국 스스로 체화하는 수 밖에 없음
칼럼 ㅊㅊ
우원재랑 진단이 같네. 다만 해결책이 다르고.
집단의 한계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