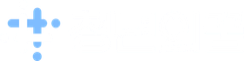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
[편집자 주]2월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다.국회가 아닌 국회의장 우원식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 건에 대한 선고다.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마은혁 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헌재재판관 8인 가운데 5명이 우원식 주장을 받아주면, 극좌 성향 마은혁 의 헌재 입성 가능성이 높아진다.우리법연구회 등 좌파 사법카르텔 출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과 김명수 가 지명한 김형두 정정미 등 5명이 우원식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은 성립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기에 8대 0으로 기각되어야 할 사안이다.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심지어 헌재가 동일한 법 논리로 전원 일치 각하한 판례도 있다.그냥 국회의장 우원식 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그에 바탕한 국회의장 우원식 명의로 청구해야 했다.
이 단순 명료한 법리를 부정하는 헌법재판관이 나온다면, "그 자는 재판관이 아니라 사법운동꾼 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만일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우원식 의 주장을 받아준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그 이후 행해질 모든 결정의 법률적 정당성은 일체 없다,
댜음은 이런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의 글이다.
《국회 의결 없는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 2025헌라1(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사건은 각하되어야 한다 -
2024년 12월 26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제1부총리)에게 송부했으나,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계선, 조한창 2인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1인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자 1월 3일 국회의장(우원식)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실을 한겨레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 의장이 이날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2025. 1. 5. 《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배제 자의적’ ...권한쟁의 청구》
이 권한쟁의청구 사건을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 사건검색 코너에서 확인하면,《사건번호 ‘2025헌라1’, 사건명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접수일자 ‘2025. 1. 3.’,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2일 이 사건에 대해 한 차례 공개변론을 열었고, 2월 3일 오후 2시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선고 3일을 앞둔 1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당시 양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제출 경위》에 대한 상세 내용을《서면으로 바로 당일 내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대리인들은 관련 경위의 입증을 위해 증인신청과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요구를 단칼에 묵살했었다.
그런데 선고 3일을 앞두고 상세한 후보자 추천 경위를 제출하라니. 그것도 당일 안에.
무슨 이런 심판 진행이 있는가?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변론을 재개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재판의 기본 아닌가? 재판의 품격과 권위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가?
그런데 이 권한쟁의심판에는 더 심각한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 다툼을 해결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헌법상의 권한은,《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과 《국회의 ‘헌법재판관 3인 선출권’》이다.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1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111조 제3항)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통령은《‘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회는《3인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가진다.
여기서《‘국회 선출’의 의미가 ‘임명’이 아님은 분명》하다.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있다.
국회가 선출했다고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그것을 ‘임명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이 쟁점은 다음 기회에 자세히 논증하기로 한다.
그에 앞서 쟁점이 되는 것은《이 사건의 ‘청구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한은 '국회'가 가진다. 《선출권을 침해당한 자도 당연히 합의제 기관인 ‘국회’》이다.
따라서《‘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은 청구인이 될 수 없다.》《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 과정에 참여해서 ‘심의·표결권’ 혹은 ‘가결선포권’을 가질 뿐》이다.
일찍이 2011년에 헌법재판소도《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2011헌라2)》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즉,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고 해서 다툼이 벌어졌는데,《동의권을 침해받은 주체는 ‘국회’이기 때문》에,《‘국회’가 권한쟁의를 청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원일치(8인)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가 있다. 참고로, 헌법(제60조)은 “국회는 …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국회’가 자신의 권한 침해를 다투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합의제 기관으로서 ‘심판청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한다. 즉《본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그 안건에 대해 심의표결 절차에 따라 의결해야》한다.
그러나《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 어디에서도 심판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1월 3일과 그 직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건'은 찾아볼 수 없다.》국회의원 수당에서 30만원의 의연금을 갹출한다는 내용의《의연금 갹출의 건》은 있어도, 심판청구의 건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겨례 신문이 보도한 대로,《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기에 앞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하여 만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한 것이라면,《‘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국회)가 청구하지도 않은 가상의 사건을 변론하고 심리한 것》이 된다.
따라서 명백히 각하되어야 한다. 만일 다른 신묘한 기교(技巧)를 부려 이 명백한 법리를 우회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의 추락은 끝이 없을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2/20250202000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