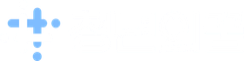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 소견의 담론
‘108석’ 국민 명령에 찬물 끼얹지 말길
미국독립전쟁(Independent War‧기간 1775년 4월~1783년 9월)은 누구나 잘 아는 전쟁이다. 미 대륙회의는 대영제국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쟁을 결의하고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을 대륙군 총사령관에 임명했다. 대륙회의는 북미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결성한 독립 관련 최고기관이다.
그러나 전쟁은 초반부터 총체적 난국이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희박했다. 그들 상당수는 주(州)도 아닌 마을 단위로 소속감‧유대감을 느꼈을 뿐 왜 새 나라를 위해, 또다른 폭군‧착취자들을 위해 목숨 바쳐야 하는지 이해를 못했다. 미국판 이완용인 베네딕트 아놀드(Benedict Arnold) 등 일부는 아예 영국을 위해 집총했다.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지목한 것도 이것이 원인이었다. 사실 워싱턴은 군재(軍才)보다는 높은 덕망으로 이름 높았다.
반면 레드코트(Redcoat) 등 대영제국 장병들은 왕(王)과 나라를 위해 피 흘리는 걸 당연시했다. 오합지졸과 정예군의 대결이니 싸움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제국군이 왔다!” 폴 리비어(Paul Revere)의 외침과 함께 대륙군‧영국군은 서로를 향해 발포했으나 이내 대륙군 진형이 무너지는 사태가 되풀이됐다. 게다가 겨우 모병(募兵)에 응한 민병대는 총소리와 함께 도주하기 일쑤여서 대륙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
때문에 워싱턴의 초창기 전략은 ‘뒤로 돌격’ 즉 도주였다. 미국이란 나라는 땅은 넓고 숨을 곳은 많기에 워싱턴은 휘하를 이끌고 사방팔방으로 진격하며 치고 빠졌다. 나중에는 워싱턴을 뒤쫓던 영국군이 제 풀에 지칠 정도였다. 워싱턴은 “철수‧후퇴도 하나의 전술이다. 우리에겐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적은 찾아왔다. 전쟁 기간에도 지속되는 식민제국의 폭압에 참다못한 많은 미니트맨(Minuteman‧1분 민병대)들이 대륙군에 속속 합류해 제국군에 함께 맞서길 선택한 것이었다.
민병대는 비록 영국군과 같은 정교한 화망(火網) 구축 등에는 실력이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사냥을 주업‧부업으로 삼던 샤프 슈터(Sharpshooter‧저격수)들은 영국군 장교들을 먼 거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살하는 방식으로 영국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 비록 미국은 독립으로부터 머잖아 미영전쟁(War of 1812)이라는 두 번째 시련을 겪게 되긴 하나, 독립이라는 ‘당장의 생존’에는 이들 민병대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미 행정부는 민병대 즉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미영전쟁에서 승리해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임기제‧민주주의란 개념이 생소해 초대(初代) 대통령 워싱턴을 왕으로 떠받들었으나 워싱턴은 임기종료와 함께 칼같이 퇴임해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오늘날 미국은 3단 고체연료 방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미니트맨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날의 국민의 선택을 기리고 있다.
22대 총선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냐 마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많은 이들이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부산시민 등 적잖은 국민은 “그래도 야권이 더 밉다”며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덕분에 국민의힘은 108석이라는 의석을 건질 수 있었다.
수백년 전 미니트맨들이 대륙회의를 도왔듯 우리 국민이 개헌저지선을 지탱해준 건 정부여당이 고와서가 아니다. 정신 차리고 내외에 맞서 나라살림과 안보를 지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지속은 불가피하고 어쩌면 미영전쟁과 같은 재앙이 또다시 정부여당을 덮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재창당에 준하는 진심어린 쇄신에 착수하고 용산은 가르치는 자세가 아닌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자세를 갖길 당부한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