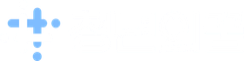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
기록적으로 낮은 출산율의 한국이지만, 특히 부산은 젊은층의 엑소더스(탈출)가 심해 도시가 소멸할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분석했다.
FT는 8일 '멸종 위기: 한국 제2의 도시, 인구 재앙을 우려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값싼 소비재 생산에 주력한 점, 효율성을 중시한 중앙정부의 중앙집중화 정책, 고급 아파트를 주로 건설하면서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없게 된 점 등을 꼽았다.
20세기 대부분 부산은 한국의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젊은층이 대폭 감소하면서 이미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의 다른 대도시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 FT의 진단이다.
2023년 한국의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 수)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2023년 서울의 출산율은 0.55명으로 더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낮아도 2.1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이다.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서울 인구는 2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부산의 인구는 그보다 더 큰 3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세현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차이점은 부산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훨씬 크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부산을 "소멸 위험 단계"에 처한 것으로 공식 분류했다. 현재 인구 330만명인 부산은 1995~2023년 60만명이 유출되면서 점차 쇠락했다.
FT 분석을 보면 부산 경제는 1990년대 이래 첨단산업 경제로 전환한 한국 경제에 합류하지 못해 악화했다. 삼성과 LG라는 굴지의 대기업이 탄생한 곳이지만, 한국의 100대 기업 중 본사를 부산에 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한국전쟁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수도 역할을 하며 기존 28만여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1951년에는 80만명을 넘어섰다. 1960~1970년대에는 국가 주도 경제개발의 혜택을 받으며 수출 경제의 무역 허브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저렴한 소비재 생산이 아닌 최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중심은 서울과 인천, 수원 등의 수도권으로 옮겨갔다. 애초 부산은 일본 자본가들이 공장을 설립해 고무와 신발에서 목재에 이르기까지 저렴한 상품을 생산하던 곳이다.
FT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도 부산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쇠퇴하는 원인으로는 수도인 서울이 국가 경제를 '중앙집권'하며 통제력을 강화함에 따라 이런 추세가 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역대 정부는 일본,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국가 집중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뒤처졌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잘못된 부산시의 도시계획도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시장들이 지역경제를 위한 신성장 분야를 발굴하는 대신 도시 외곽의 공공토지를 개발업자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이 매각은 고급 해안가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외국인들의 자금에 힘입어 부동산 붐을 일으켰다.
그 결과 집을 살 돈을 모으지 못한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반면 이미 재산이 있는 나이 든 사람들만 혜택을 입어 세대간 부 격차가 심해졌고 젊은이들이 부산에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부산 시민단체인 '사회복지연대'의 이승한 사무총장은 "그들은 시장이라기보다 부동산 개발업자처럼 행동했다"며 "부산(釜山, 가마솥 모양 산이 많다는 의미)은 문자 그대로 '많은 산'을 의미하지만, 이제 우리는 '많은 아파트의 도시'라고 부른다"고 자조적으로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0/20250210001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