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못할 사정에 이역만리 망명했던 소무와 이릉
洪 흉상 이전 찬반논란…역린 건드리는 건 아닌지
소무의 이야기
소무(蘇武‧생몰연도 ?~기원전 60)는 전한(前漢)의 관료다.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등에 의하면 소무는 한무제(漢武帝) 명을 받아 흉노(匈奴)에 사절로 파견됐다. 흉노 선우(單于‧황제) 저제후(且鞮侯)가 억류된 한인들 석방하고 화친을 청하자, 맞대응으로 영어(囹圄)에서 풀려난 흉노인들을 북방까지 호송하는 게 소무의 임무였다.
소무와 동행한 이들 중엔 장승(張勝)이란 이가 있었다. 장승은 소무 몰래 흉노의 구왕(緱王) 등과 밀통(密通)했다. 구왕은 흉노에 빌붙은 한인 위률(韋律)과 저제후를 죽일 계획 꾸미고 있었다. 거사(巨事)가 성공하면 장승이 무제에게 상주(上奏)해 한나라에 사는 구왕 일가에게 큰 상을 내린다는 게 장승‧구왕 밀통 내용이었다.
구왕 등은 실제 행동에 착수했다. 저제후는 어느날 연지(閼氏‧황후)의 자제들만 데리고 사냥길 떠났다. 구왕 등 70여명은 저제후를 활로 쏴 죽이려 했으나 직전에 한 공모자가 흉노에게 밀고(密告)했다. 구왕은 저제후에게 죽임 당하고 나머지는 사로잡혔다.
두려워진 장승은 그제야 소무에게 내막을 털어놨다. 흉노에 가도 외환죄(外患罪) 등으로 처형될 게 뻔하고, 한에 돌아가도 기군망상(欺君罔上) 등으로 멸족(滅族)될 게 뻔한 소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당초 자결하려다 장승 등 만류로 그친 소무는 저제후 앞으로 나아갔다.
예상대로 70여명 중 일부는 “장승도 공모자”라고 흉노에게 실토했다. 분노한 저제후는 사절단 총책임자인 소무에게 모든 책임 덮어씌웠다. 수사임무 띤 반역자 위률이 도착하자 소무는 “내가 부덕(不德)해 나라에 큰 해를 끼쳤다”며 차고 있던 검을 뽑아 제 가슴을 찔렀다.
소무는 황급히 달려온 흉노 의관(醫官)에 의해 기적적으로 목숨 건졌다. “대장부(大丈夫)로다” 감탄한 저제후는 소무를 죽이는 대신 제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 저제후는 우선 70여명 중 몇 명의 목을 친 뒤 “날 따르지 않으면 다른 놈들도 죽이겠다” 소무를 협박했다.
소무가 이치를 들어 연좌(連坐) 부당함을 준엄히 지적하자, 저제후는 위률을 시켜 이번엔 재물로 유혹토록 했다. 위률은 “나는 선우의 은혜로 왕호(王號) 얻고 수만명의 무리 거느리고 있다. 소군(蘇君)도 투항한다면 당장 내일부터 나와 같은 부귀(富貴) 누릴 것”이라고 꼬드겼다. 허나 소무는 “은혜도 의리도 모르는 놈”이라며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부했다.
이도저도 안 되자 성질 뻗친 저제후는 소무를 깊은 구덩이에 홀로 유폐(幽閉)시키고서 밥과 물조차 주지 않았다. 소무는 대쪽 같은 절개(節槪) 잃지 않고서 입고 있던 가죽옷을 씹어 먹고 하늘의 눈을 녹여 마시며 수일을 버텼다.
결국 백기 든 저제후는 소무를 혹독한 기후 기다리는 북해(北海), 즉 지금의 바이칼호수(Lake Baikal)로 유배 보냈다. 그리고는 평생 유목(遊牧)이라곤 안 해 본 소무에게 양치기 등으로 자급자족(自給自足)토록 하는 한편, “숫양에서 젖이 나오면 한으로 돌려 보내주겠다” 조롱했다. 수컷이 잉태(孕胎)할 리 없으니 죽을 때까지 소무를 가둬놓겠다는 뜻이었다.
소무는 처음엔 들쥐를 잡거나 열매를 따는 등 원시적 수렵채집(狩獵採集)으로 연명하면서, 유목기술을 하나씩 독학(獨學)으로 터득해나갔다. 그렇게 소무가 흉노에 억류된 시간은 자그마치 ‘19년’에 달했다.
의지가 약해질 법도 했으나, 소무는 검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한나라 부절(符節)을 지팡이 삼아 짚고 다니며 고국을 잊지 않고 고향땅을 그리워했다. 무제가 붕어(崩御)했다는 소식 접하자, 이역만리(異域萬里)에 발 묶인 제 처지 비관하며 통곡하고 토혈(吐血)했다.
소무는 어느덧 칠흑같이 머리 새까만 중년(中年)에서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년(老年)이 다 됐다. 그러던 어느날 기적 같은 낭보(朗報)가 찾아왔다. 무제에 이어 즉위한 소제(昭帝)가 소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채고 “당장 석방하라” 흉노에 요구한 것이었다.
당초 흉노는, 마치 일본인 납북(拉北) 후 가짜유골 일본에 보낸 김정일처럼, “소무는 이미 죽었다” 뻗댔으나 금세 들통났다. 소무는 무려 19년만에 귀로(歸路)에 오를 수 있었다. 소무는 이미 현지에서 처자식까지 두고 있었으나 미련 없이 고국(故國)으로 향했다.
꼼짝없이 혼백 된 줄로만 알았던 충신(忠臣)의 생환에 한나라 조야(朝野)는 눈물바다가 됐다. 소무는 “선제(先帝)시여, 신(臣)이 돌아왔나이다” 무제 황릉(皇陵) 앞에 엎드렸다. 아내는 이미 재가(再嫁)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나 소무는 누구도 원망치 않았다. 천자에게 주청(奏請)해 흉노에서 낳은 아들 소통국(蘇通國)을 데려온 소무 부자(父子)는, 흉노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파란만장한 삶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한에 충성했다.
이릉의 이야기
이릉(李陵‧생몰연도 ?~기원전 74)은 소무와 동시대에 살았던 전한의 무장(武將)이다. 그의 조부(祖父)는 이광사석(李廣射石) 고사로 유명한 이광(李廣)이다.
이릉 또한 초인적 용병술(用兵術)로 이름 떨쳤다. 침략자 흉노와의 전쟁 벌이던 무제는, 그 자신은 무척 아꼈으나 무능했던 장수 이광리(李廣利) 지원을 위해 이릉을 파견했다. 이릉은 보병 5000명만 이끈 채 출정했다. 허나 과정에서 일이 꼬여 이릉은 집단군(集團軍) 편제에서 제외돼 홀로 움직이게 됐다. 즉 그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올 원군(援軍)은 없었다.
이릉이 맡은 임무는 저제후 본대(本隊)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어 이광리 측 진병(進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었다. 유인 후에는 이릉을 재빨리 기동시켜 이광리와 합류케 한다는 게 무제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동서고금(東西古今) 누구도 ‘전장의 안개(fog of war)’를 피할 순 없었다. 불운하게도 이릉 코앞에는 저제후의 3만 대군이 신기루(蜃氣樓)처럼 등장했다.
상술했듯 이릉 측 전력은 보병 5천이 전부였다. 반면 흉노는 어지러이 내달리며 파르티안 사법(Parthian shot) 등으로 상대를 사냥하듯 잡는 궁기병(弓騎兵)이 주력(主力)이었다. 흉노는 끊임없이 물자‧병력 보급 받으며 제파전술(諸波戰術)에 나설 수 있었다. 이릉 측은 5천 보병이 촘촘한 방진(防陣) 쌓는다 해도, 포위당한 채 보급이 다하거나 체력이 고갈돼 한 점만 뚫리면 끝이었다.
하지만 상술했듯 이릉은 초인적 용병술을 발휘했다. “한 줌도 안 되네” 우습게 본 흉노군이 접근하자 이릉 측 궁노(弓弩)가 비처럼 쏟아졌다. 초전(初戰)에 깨강정이 된 저제후는 주변의 병력이란 병력은 모조리 소집했다. 3만 흉노군은 ‘8만’으로 불어났다.
이릉은 방진을 유지하고 응사(應射)하는 동시에 병력을 조금씩 이동시켰다. 수십㎏의 쇠방패 또는 수백㎏의 철수레 들고 간격 유지하며 움직이다 보면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릉 휘하 정예(精銳)들은 태산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흉노는 어떻게든 한 점을 비집고 들어가 헤집어놓으려 했으나 이릉 측은 조금의 공백(空白)도 허용치 않았다.
이릉은 어느 산골짜기에 이르러서야 추격이 덜해지자 군(軍)을 재정비했다. 상당수 장졸(將卒)이 죽거나 다치고 지원군이라곤 여전히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았기에, 이릉은 중상자(重傷者)는 수레에 태우고 경상자(輕傷者)는 수레를 끌도록 한 뒤 안전지대까지 계속 이동토록 했다. 이릉의 용맹에 질려버린 저제후는 “힘들다. 그만 싸우자” 포기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 한 잡병(雜兵)이 대사(大事)를 그르쳤다. 이릉 수하였던 관감(管敢)이란 인물은 저 혼자 살겠다고 흉노에게로 달아났다. 또 “이릉군은 화살도 다 떨어졌고 지원병도 없다. 재빨리 쫓아가면 이길 수 있다” 일러바쳤다. 무릎을 탁 친 저제후는 정예를 총동원해 이릉을 쳤다. 이릉군은 3천으로 줄었으며 수레마저 버려야 할 처지가 됐다.
천하의 이릉도, 아니 인류전사(戰史)상 그 어떤 내로라하는 명장이 온다 하더라도, 이쯤 되면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또다른 산골짜기에서 완벽히 포위된 이릉은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체념했다. 독자적으로 포위망 뚫으려 했던 일부 병사들은 몰살(沒殺)됐다.
이릉도 이국(異國)땅을 무덤 삼으려 했으나, 저 혼자 순국(殉國)하는 건 쉬웠으나, 그에겐 살려야 할 수하들이 있었다. 병사들은 “임의로 흉노에 투항하자”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다” 눈물로 애걸했다. 결국 이릉은 피눈물 삼키며 백기 들고 말았다.
이릉이 그만큼 버티는 사이 흉노 측 사상자는 ‘1만’에 달했다. 저제후는 소무 때와 마찬가지로 “대장부로다” 이릉을 중용(重用)했다. 반면 무제는 전후사정 알아보지 않고 한에 잔류한 이릉 일가(一家)를 멸족했다.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司馬遷)이 이릉을 변호했으나 불똥은 그에게마저도 튀었다. 사마천은 이 때 “너 죽을래, 환관(宦官)될래” 무제 협박에 치욕 무릅쓰고 궁형(宮刑)을 택했다. 그에겐 사기 완성의 대업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릉은 이제 정말 귀국(歸國)할 까닭이 없었다. 허나 그는 위률 같은 무리와는 달리 저제후 곁에 매미처럼 붙어 지내며 저자세로 굽신거리지 않았다.
이릉이 소무를 찾아가 만난 것도 투항 직후였다. 이릉은 무제 사후(死後) 옛 붕우(朋友)가 몰래 찾아와 귀환을 청하자 “나는 이미 오랑캐의 옷을 입고 있다” “장부(丈夫)는 두 번의 치욕은 받지 않는다” 고개 내저으면서도, 소무의 지조(志操)에 자기자신을 크게 부끄러워하는 등 죽을 때까지 고국을 잊지 않았다.
홍범도의 이야기
홍범도(洪範圖‧1868~1943) 장군은 천출(賤出)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독립에 헌신한 독립유공자다. 젊어서부터 의협심(義俠心)‧애국심 강하고 사격술에 능했던 장군은 1920년 봉오동전투‧청산리전투 등에서 독립군을 지휘해 일본군을 대파(大破)했다.
허나 장군은 소련으로 망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설왕설래(說往說來) 오가지만,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 문헌에 의하면 만주(滿洲)에 고립되다시피 한 채 일본군 맹공(猛攻)에 직면하자 러시아군 지원을 받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계기가 돼 불가피하게 소련에 잔류하게 됐다는 게 이들 문헌 설명이다. 장군은 1921년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 소식 접하자 통곡했다는 설(說)도 있다. 해당 참변은 붉은군대(red army)에 의한 통수권(統帥權) 접수를 거부한 독립군들이 소련공산당에 의해 무자비하게 학살‧진압된 사건이다.
장군과 공산권 간 갈등은 주영(駐英) 북한대사관 공사(公使)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증언에서 교차검증된다.
태 의원은 2021년 8월 “김일성은 자신의 (거짓) 항일(抗日)업적만 내세우기 위해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전투와 같은 독립무장활동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때문에 소련공산당에 의한 카자흐스탄 강제이주 후 이역만리에 묻힌 장군 유해(遺骸)를 북한으로 송환받을 생각조차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군이 대한민국에 귀국하지 않은 건 소무‧이릉과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게 적잖은 학자들 시각이다. 이러한 장군 흉상(胸像) 이전이 육군사관학교에 이어 국방부에서도 검토된다는 소식이다.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으나, 1962년 장군에 대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건국훈장(建國勳章) 대통령장(大統領章) 추서(追敍)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국민의 보편적 역사관‧역린(逆鱗) 건드리는 건 좋을 것 없다. 정부의 숙고(熟考)를 바란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email prot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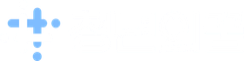





















사족을 말씀드리자면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는 만주의 빈주에서 동포들을 학살한 '빈주 사건'의 주동자 전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민부가 해체되는 결과를 야기했죠. 김좌진 장군의 경우에는 흉상 밑에 해당 사건을 적어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련을 왜갔냐고 따지는건 조금 슬프네요. 그땐 나라가 없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