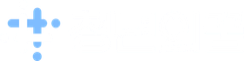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 담은 담론
한동훈, 박희처럼 기성체제 뒤엎을 수 있을까
<계산 없는 우직한 성격>
효문태후(孝文太后) 박씨(薄氏‧생몰연도 ?~기원전 155)는 한고조(漢高祖)의 후궁이었다. 실명은 알 수 없고 흔히 박희(薄姬)로 불린다.
박희는 본래 다른 남자의 여자였다가 남편이 한고조에게 항복하자 전리품처럼 바쳐진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다. 그러나 후일 문경지치(文景之治)의 태평성대를 여는 전한(前漢) 5대 황제 문제(文帝)를 낳고 말년까지 평안히 사는 등 인생역전을 이룬 인물이기도 하다.
박희의 모친은 위(魏)나라의 왕족이었다. 위나라가 진시황(秦始皇)에 의해 멸망하자 모친은 오(吳) 지역 남성과의 사이에서 박희를 얻었다. 통일 진제국이 2대만에 진승오광(陳勝吳廣)의 난으로 혼란에 휩싸이고 그 틈에 위나라가 재건되자 박희는 위왕(魏王) 위표(魏豹)의 후궁이 됐다. 유명한 여류 관상가 허부(許負)로부터 “당신은 장차 천자(天子)를 잉태할 것이다”는 점괘를 받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허나 남편이라는 작자는 한심하기 그지없었다. 위표는 당대의 ‘배신의 아이콘’이었다. 그는 처음엔 항우(項羽)의 초(楚)나라에 붙었다가 대세가 한(漢)에게로 기우는가 싶어지자 한고조에게 가담했다.
그런데 한고조의 60만 대군이 팽성(彭城)에서 3만 항가군(項家軍)에게 패하자 어느새 항우에게 다시 붙어 까불었다. 그러던 중 북벌 나선 한신(韓信)에게 박살나 한군(漢軍)의 포로가 되자 재차 한고조에게 항복해 알랑방귀 뀌고 뒤로는 배신 꿈꾸다가 끝내 “이 검은머리 짐승” 꾸짖은 한고조 수하들에게 참살되는 등 화려한 전적 자랑했다.
위표가 한신에게 패해 한고조에게 사로잡히자 박희는 전리품처럼 한나라에 바쳐졌다. 한 때 제왕의 아내였던 박희는 직조실(織造室)에서 옷감 짜는 신세가 됐다. 그런 박희를 본 한고조는 측은한 마음에 제 후궁으로 거뒀으나 해가 지나도록 관계를 맺지 않았다. 유일하게 한 번 동침(同寢)했을 때 박희가 품은 아이가 바로 한문제 유항(劉恆)이었다.
박희는 망국(亡國)의 왕족이었으나 성품은 단호하고 우직했던 듯하다. 단적으로 그 악독한 고황후(高皇后) 여치(廢雉)의 마수(魔手)마저도 피해간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고조의 정실(正室)이었던 여치는 질투‧권력욕의 화신이었다. 한 때 항우의 포로가 됐던 여치는 풀려나자마자 남편의 후궁 등 정적 숙청에 나섰다. 대표적 타깃이 척희(戚姬)였다.
여치는 제 아들을 태자(太子)에 올리려 하면서 자신과 궁중암투 벌인 척희를 ‘인간돼지’로 만들어 죽여버렸다. 여치는 또 그 처참한 광경을 제 아들 유영(劉盈)에게 강제로 보여주기까지 했다. 척희의 아들 유여의(劉如意)도 여치에게 독살당했다. 해당 이야기는 필자가 앞선 칼럼에서 쓴 적이 있고 내용도 대단히 잔혹하므로 본 개담에서는 생략한다.
이러한 여치도 박희는 가엽게 여기고 잘 대해줬다. 박희는 이미 한고조와 한 이불 덮은 적이 있었고 박희가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여치에겐 큰 위협이 될 법도 했으나 여치는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항이 한고조로부터 대왕(代王)에 봉해지자 박희‧유항 모자(母子)를 대나라로 고이 보내줬다.
이유는 박희의 성품에 있었다. 박희는 척희처럼 이리저리 재고 잔머리 굴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는 제 본분(本分)을 알고서 여치를 해할 음모를 꾸미거나 따위의 행위는 일절 삼간 채 제 할 일만 했다. 여치와도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박희는 훗날 황태후(皇太后)에 오르고서도 여치처럼 전횡(專橫) 일삼거나 하지 않고서 우직한 태도를 단호히 견지해 주변의 큰 존경을 받았다.
<모두가 “글쎄요” 할 때 외친 “뽑아요”>
이러한 박희의 스타일은 2012~2013년 드라마 초한전기(楚漢傳奇)에서 한고조의 화살 피격신과 얽혀 각색돼 한 층 부각됐다.
한고조 피격사건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다. 한고조가 직접 항우의 본대를 묶어두는 사이 북쪽으로는 한신이 위‧연(燕)‧제(齊) 등 여러 나라를 평정해 항우를 압박하고, 남쪽으로는 노예왕 영포(英布)가 항우 뒤를 들이치며, 그 틈틈이 거야(巨野)의 수적(水賊) 팽월(彭越)이 항우 보급로를 끊어 굶긴다는 게 한나라의 대초(對楚) 전략이었다.
항우로서는 자신이 직접 영포‧팽월을 치러 가면 한고조가 뒤를 들이치고, 한고조를 공격하러 말머리 돌리면 숨었던 영포‧팽월이 뒤통수를 갈기니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다. 한신을 제압하랍시고 10만 대군을 딸려 보낸 용저(龍且)는 애당초 대패해 패사(敗死)한 터였다. 설상가상 유일한 브레인이었던 범증(范增)마저 한고조의 책사 진평(陳平)의 이간질에 의해 분사(憤死)하고 없었다.
드디어 꼭지가 돌아버린 항우는 이를 갈며 한고조에게 만나자고 청했다. 먼발치의 한군(漢軍) 진영에서 한고조가 모습 드러내자 항우는 “천하가 혼란스러운 건 우리 때문인데 차라리 우리 둘이 단기접전(單騎接戰)으로 승부를 내자” 요구했다. 완력(腕力)에선 항우 발끝에도 못 미치는 한고조는 당연히 코웃음치고 거절하면서 항우를 모욕했다. 눈이 뒤집어진 항우는 미리 준비했던 활과 화살을 꺼내 한고조의 가슴팍을 맞춰버렸다.
한고조는 자신이 비명 질렀다간 그 날로 군심(軍心)이 크게 동요해 목전에 다가온 천하통일이 어그러질 수 있음을 잘 알았다. 더구나 상대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전설적 용장 항우였다. 항우가 한군의 어수선함을 노려 밀고 들어오면 대세(大勢)는 어찌될 지 알 수 없었다. 때문에 한고조는 특유의 넉살스러움으로 억지로 웃으며 “저 꼬마가 운 좋게 이 어르신의 발가락을 맞췄구나” 항우를 조롱했다.
허나 가슴팍에 강궁(強弓)이 박혔으니 중상은 피할 수 없었다. 화살 한두 개 쯤 맞아도 껄껄 웃는 대중매체 묘사와 달리 화살은 대단히 위력적인 무기다. 화기(火器)와 화살의 차이는 지금 당장 죽느냐, 좀 있다가 죽느냐 정도라고 한다. 화살대를 부러뜨린 뒤 장졸들 보지 못하게 옷으로 덮고서 식은땀 흘리며 막부(幕府)까지 돌아온 한고조는 곧장 혼절해 쓰러졌다.
만에 하나 한고조가 숨지기라도 한다면 그 날로 군심은 무너지고 한신‧영포‧팽월 등 여러 군벌들도 독립해 한나라는 멸망할 게 뻔했다. 당장 어의(御醫)를 독촉해 한고조를 살리는 게 급선무였으나 어의가 “화살촉을 뽑을까요, 말까요?” 묻자 척희‧소하(蕭何) 등 왕족‧백관들은 몸 사리기 급급했다. 이들은 “뽑아라. 내가 책임진다” 했다가 한고조가 과다출혈‧쇼크 등으로 사망한다면 공공의 적으로 몰려 제 일족이 멸족될 것을 먼저 염려했다.
한고조가 가장 총애한다는 후궁도, 한고조가 가장 신임한다는 재상도 일신(一身)의 안전만 위하고 서로 눈치싸움하면서 모두가 시간만 흘려보내자 나선 게 박희였다. 그는 왕족으로서 세력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복잡한 셈법 없이 “뽑아요” 어의에게 단호히 명령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 내쉰 좌우는 일사분란하게 수술 준비를 도왔다. 천우신조(天佑神助)로 한고조는 되살아났다. 만약 그 때 박희의 결단이 없었다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터였다.
<韓 ‘계산 없는 정치’가 성공하려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계산 없는 선의(善意)’를 언급했다. 또 연평도포격 당시 한 달 동안 연평도 주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한 인천의 한 찜질방 등을 ‘계산 없는 선의’의 사례로 열거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낯선 사람들 사이 동료의식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대략 감이 온다.
그간 정치권 상당수 인사들은 서로의 눈치보고 책임전가하며 이해득실 따져온 게 사실이다. 당(黨)과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살고보자는 식의 선사후당(先私後黨) 태도가 만연했던 게 현실이다. 한 위원장의 ‘동료의식’ 발언에 앞에선 박수치고 뒤에선 비웃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한 위원장이 드라마에서 묘사된 약 2200년 전의 인물 박희처럼 우직하게 총대를 메고서 생물학적 나이를 떠나 상당수가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기성정치권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척희처럼 공언(空言)에 그칠지 주목된다.
다만 이 한마디는 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한 위원장부터 책임전가가 아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솔선수범(率先垂範)에 나서야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어쩌면 논란의 비대위원 인선(人選)에 대한 침묵 대신 솔직담백한 사과가 그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