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5483#home
- 어떻게 비슷한가.
- 일단 맥락을 떼어 놓는다. 특정한 사실의 배후를 걷어낸다. 그중 가장 자극적인 걸 끄집어내며 ‘말이 되느냐’고 상대방을 비난한다. 상대가 역공하면, 전혀 다른 맥락을 끄집어내어 흔든다. 그러면 상대방은 속칭 ‘털린다’. 거의 깨진 적 없는 방식이다. 이 와중에 또 능수능란하게 유머를 활용한다. 전장연과의 토론을 보면 이 대표는 자주 “농담입니다” 같은 말을 한다. 농담 듣고 열 낸 사람만 바보가 된다. 기가 빨린다. 일베의 논쟁 방식이 보통 이렇다. 이준석 대표가 일베를 하느냐? 그건 관심 없다. 그의 말이 혐오를 담지 않더라도, 논쟁 방식과 그 과정상의 유머·밈 활용, 사실을 조합하는 방식이 일베의 그것과 매우 닮았기에 기시감이 들었을 뿐이다.
- 이준석과 ‘일베’의 차이는 뭘까.
- (일베가) ‘제도화’됐다고 주로 표현한다. 이준석 대표와 ‘일베·펨코(에펨코리아)’ 관계를 봤을 때, 이준석은 당대 20대 남성의 정서, 소통 양식, 논쟁과 논증 형식 등을 체화했다는 걸 느낀다. 이런 일베의 ‘엑기스’를 뽑아 제도화시켰다고 본다. 책에서 “이준석은 일베의 현신(現身)”이라고 규정했다. 정치적으로 이 대표의 성과는 경탄할 만하지만, 그게 한국 사회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할지 의심이 든다. 소수자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고 세력화될 것 같다. 궁극적으로 이준석이 공당 대표라면, 방향이 다른 목소리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혐오’ 과잉 소비 사회
- 우리 사회에 이런 ‘혐오’에 대항·견제할 동력이 안 보인다.
- 일베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미 진보 진영에서 예전부터 혐오에 준하거나 그보다 심한 말을 온라인에서 문제의식 없이 해왔다. ‘강자니까, 메이저니까 욕해도 돼’,‘풍자야’,‘패러디야’라면서 나이브하게 넘어갔다. 예컨대 ‘워마드’에서 혐오 표현을 썼을 때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을 못 했다. ‘우리 편이니까, 까도 내가 까’라는 게 있었다. 물론 맞다. 이해한다. 하지만 공론장, 적어도 학계에선 분명 비판적으로 다뤘어야 한다. 밑바닥에 흐르는 이야기에 대한 관찰과 측정, 평가와 토론이란 장치가 작동 안 했다.
- 혐오는 이제 ‘일베’ 만의 문제도 아니지 않나. ‘혐오 사회’라고들 한다.
- 혐오가 넘실대며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제도화되기도 했다. 다만 우리 사회를 ‘혐오 사회’라고 규정하는 건 반대한다. ‘혐오 사회가 됐다’는 건 ‘없던 혐오가 새로 생겨났다’는 뜻인가. 그렇진 않다. 또 혐오라는 말을 과하게 쓴다. 오염된 것 같다. 혐오(hate)를 ‘극혐(disgusting)’과 혼동하기도 한다. 우리가 자주 쓰는 혐오는 ‘극혐’에 가까운 개념이다. 온라인 소통이 만연해 생긴 일 같다. 숨기지 않고 혐오스러운 말을 뱉으며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커진 만큼 혐오 발언을 들으며 느끼는 고통도 그만큼 많이 쌓였다.
그냥 웃긴데 맞는 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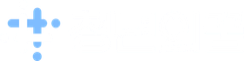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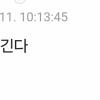














ㅋㅋㅋㅋㅋ
흠 걍 패스
이건 초기 일베를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얘기 지금일베나 펨코에 논쟁이나 논증이 존재한다고 보는것도 사실과 맞지않고 초기 일베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쓴 글이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