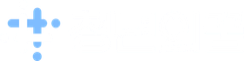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의 담론
관계자 유사행보 끝에 패가망신한 항우
필자 개담의 단골 출연자 항우(項籍‧생몰연도 기원전 232~기원전 202)는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치료가 누구보다 필요하던 인물이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반은 간다고 했거늘, 항우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다 상대 체급만 키워주고 자멸한 필부(匹夫)다.
항우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화려하다. ‘만인적(萬人敵)’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 ‘서초패왕(西楚覇王)’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항우에게 독으로 작용했다. 자신이 정말로 남들 머리 꼭대기에 서 있다고 믿은 항우는 제 손으로 제 무덤 팠다. 대표적 사례가 백성을 살리는 치자(治者)라는 본분을 망각한 양민학살 릴레이다.
항우는 마치 “백성은 그저 내 부귀영화(富貴榮華)를 위한 도구일 뿐” 외치듯 수틀리면 강산 곳곳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그는 숙부인 항량(項梁) 생전에 이미 양성(襄城) 공성전에서 성내 민간인 수천 명을 모조리 쳐 죽였다. “이것들을 본보기로 전부 제껴서 내가 이만큼 강하다는 걸 적(진나라)에게 과시할 필요가 있다. 진(秦)나라는 이것들 살리고 싶으면 항복하라”는 메시지도 던지기 위함이었다.
이는 당연히 역풍으로 작용했다. 경악한 천하 만백성은 “항우는 백성을 진심으로 받드는 게 아니라 버러지처럼 여긴다. 백성을 제 권세에 이용하다 필요하면 막 해치는 악귀‧야차(夜叉)다”고 손가락질했다. 그간 주변의 온갖 아부 앞에 콧대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던 항우 그 자신만 이를 몰랐다. ‘자뻑’한 이 우물 안 개구리는 정말로 인질극‧학살극이 효과 있다고, 또 ‘하찮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감히 대들지 못할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항우는 기원전 207년엔 항복한 진나라 패잔병 수십만을 산 채로 구덩이에 파묻어 죽였다. 살해된 병사들 중엔 진나라 토박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옛 육국(六國) 출신도 상당수였다. 동년 12월 항우는 진나라 수도 함양(咸陽)을 정복하고서, 진나라는 이미 멸망했음에도 이번엔 한고조(漢高祖) 등 잠재적 라이벌들에게 제 힘을 과시하려는 듯, 또다시 백성들을 무참히 도살했다.
초한전쟁(楚漢戰爭)이 시작된 후인 기원전 205년엔 “나 이렇게 막 가는 놈이다. 한고조 저놈 때문에 너희 백성이 이 고초 겪는 거다. 저놈을 원망해라” 우기듯 제(齊)나라 토벌 과정에서 지나는 고을마다 몽땅 아작을 냈다. 팽월(彭越)의 근거지 외황(外黃)을 쳐서 무너뜨리고선 “그냥 다 죽여버려라” 외치려다 한 어린아이의 호소에 “살려는 줄게” 거드름 피며 선혈 낭자한 칼을 거둬들였다.
이 외에도 항우가 삶아 죽이고 불 태워 죽인 무고한 이들은 차고 넘친다. 포로가 된 한고조의 장수 주가(周苛)는 펄펄 끓는 물속에 던져져 목숨 잃었다. 한고조로 위장해 초군(楚軍) 추격대를 유인했던 기신(紀信)도 항우에게 사로잡한 뒤 산 채로 불붙은 장작더미 위에 섰다. 항우는 제 상전인 초의제(楚義帝)마저도 강물에 투신토록 몰아세웠다.
이러한 ‘국민밉상’ ‘공공의적’ 항우가 초한전쟁 과정에서 한고조를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자연히 한고조를 따르는 백성은 늘어만 갔다. ‘적(항우)의 적(한고조)은 아군’인 법이고 한고조에 대한 동정론과 동병상련(同病相憐)의 감정도 치솟았기 때문이다. 귀족 출신인 항우는 철저한 금수저인 반면 농가(農家) 출신 한고조는 철저한 흙수저였다.
양 측 지지율을 보여주는 게 병력 숫자다. 전쟁의 마지막 대결인 기원전 202년 해하전투(垓下之戰)에서 한군(漢軍)은 약 30만인 반면 초군은 약 10만에 불과했다. 그 10만도 사면초가(四面楚歌) 등에 따른 줄탈영 앞에 ‘800’으로 줄었다가 ‘100명’으로, ‘28명’에서 종래엔 ‘0명’으로 급감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항우는 결국 제 손으로 한고조를 지존(至尊)으로 만들어준 끝에 그 지존에게 단숨에 응징당한 셈이다.
국민생명을 볼모 삼아 대통령실과 대립 중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고위관계자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물의 빚고 있다. 홍 시장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이고 신사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인신공격으로 여겨질 여지가 매우 큰 발언을 한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지금 세상이 ‘의협천하’라 착각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의협과 당사자를 바라보는 민심(民心)은 지극히, 극도로 악화돼 있다. 이는 심지어 영수(領袖)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다. 그리고 많은 국민은 그 의협에 쓴소리하는 홍 시장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 관계자는 아는지 몰라도 국민은 공복(公僕)을 선출하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복수불반(覆水不返) 즉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 그리고 대자대비(大慈大悲)에도 한계는 있는 법. 당사자가 향후 수년 뒤 어쩌면 벌어질 수도 있는 사태를, 어쩌면 그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운명을 어찌 감당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업보(業報)를 어찌 짊어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 없다면 지금이라도 의료인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보이고, 자신 있다면 지금 하는 그대로 계속 하면 된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