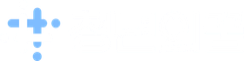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
서울시가 집값 안정화와 투기 억제라는 명분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가 '계륵'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도 1년 더 연장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어서다.
규제로 인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수요가 차단됐음에도 집값이 주변보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뛰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규제를 풀기도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건드렸다가 주택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요 재건축단지 등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지난달 26일자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집값이 연일 뛰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 한강변의 핵심 재건축 입지로 손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196㎡(이하 전용면적) 13층이 지난 3월에 80억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2021년 1월)보다 26억1000만원 올랐다.
같은 달 목동 신시가지9단지 156㎡(11층)는 28억원, 목동 신시가지5단지 95㎡(2층)는 22억500만원에 거래되면서 각각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는 현재 모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해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한 곳이다.
성수동에서도 직전 신고가 대비 많게는 수억원씩 오른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장미아파트 53㎡(5층)는 직전 신고가 13억7000만원에서 2억8500만원 오른 16억5500만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다시 썼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의 주요 목적은 아파트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집값 상승이 보장된 곳이라는 인식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때 인근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모두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2020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자 국토부가 두 달 뒤 전격 도입했다. 특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폐기해야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처럼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거래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 압구정 등 강남 주요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만 봐도 큰 효고가 없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03/20240503001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