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 소견의 담론
조정실세 당귀도 뿌리친 신용의 태사자
거국적 차원서 이재명發 당귀 뿌리치길
태사자(太史慈‧생몰연도 서기 166~206)는 후한(後漢) 말 인물이다. 이름 어감이 굉장히 멋있어 1990년대에 동명(同名)의 아이돌그룹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태사자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고 담력도 무모할 정도로 굉장했다.
태사자는 186년 무렵 고향인 청주(靑州) 동래군(東萊郡)에서 관리로 근무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두고 주자사(州刺史‧지방감찰관 격)와 태수(太守‧시장 격)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 때문에 자사부(刺史府) 파견 관리와 태수가 파견한 관리 즉 태사자는 “내가 먼저 수도 낙양(洛陽)에 들어가 우리 정책안을 조정에 올려야 한다” 치열한 레이싱 시합에 나섰다.
말 궁둥이를 불똥 튀게 휘갈겼음에도 태사자는 간발의 차로 늦게 입조(入朝)했다. 자사부 관리가 의기양양히 자기네 공문(公文)을 담당 부처에 올리려는 찰나, 태사자는 “내가 졌소. 그런데 질 때 지더라도 당신네 정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나 집시다” 요구했다. “그러시든가” 자사 측 관리가 공문 보여주자 태사자는 대뜸 두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관리가 대경실색(大驚失色)하자 태사자는 “속았지롱. 넌 이미 자사에게 죽은 목숨이다. 나도 공문 훼손한 죄인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함께 달아나자” 꼬드겼다. 관리가 앞장서서 내달리자 태사자는 따라가는 척 하다가 유턴해 자기네 군청(郡廳) 측 공문을 올렸다.
이 일로 태사자는 “간이 배 밖에 나온 놈” 이름 떨쳤으나 지은 죄가 있으니 지명수배자가 돼 머나먼 요동(遼東)으로 홀로 도주했다. 물론 공문서 훼손은 오늘 날에도 해선 안 될 범죄이므로 혹여 따라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자.
요동에 둥지 튼 태사자는 험상궂은 선비(鮮卑)‧오환(烏桓)족들과 투닥거리면서 “여긴 사람 살 데가 아니구나. 고향 있을 때가 좋았다” 개심(改心)했다. 그러던 중 황건적(黃巾賊)의 난이 발발하고 세상이 혼란에 휩싸이자 은근슬쩍 청주로 귀향했다.
북해상(北海相‧군국제의 군국 중 국의 태수 격) 공융(孔融)은 졸지에 아들 잃어버린 태사자의 노모(老母)를 돌봐주고 있었다. 불효자 태사자는 공융에게 깊이 감사했으나 임관하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천하 곳곳을 들쑤시고 다니던 황건적들이 북해국(北海國)도 털어먹고자 몰려왔다. 태사자는 공융의 은혜를 갚고자 구원을 청할 사자(使者)를 자처했다.
혈혈단신 떨쳐 일어선 태사자는 성문 열어젖히고 나갔다. 관병(官兵) 나오는 줄 알고 창칼 휘두르던 도적떼는 희한한 광경 목격했다. 웬 젊은이 하나가 나오더니 상큼한 미소로 에어로빅 체조하거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등 저 혼자 놀다가 다시 쑥 들어간 것이었다. 이튿날에도, 그 이튿날에도 태사자는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다.
“동바(동네바보)인가 보다” “오징어게임 촬영하나 보다” 긴장 풀어버린 도적들은 캠프파이어 열어 먹고 취했다. 그제야 태사자는 갑주(甲胄) 걸치고 창 꼬나든 채 대갈일성(大喝一聲) 내지르며 뛰쳐나갔다. 수만 황건적 사이를 수풀 지나듯 뚫고 지나간 태사자는 평원(平原)의 유비(劉備)로부터 수천 병마(兵馬)를 빌려 돌아왔다. 지원군 온다는 소식에 도적떼는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태사자는 이 일로도 담력을 내외에 과시했다.
목숨 걸고 동래군 태수와 공융의 은혜를 갚은 점에서 보듯, 태사자는 담력에 앞서 신용(信用)으로 더 큰 명성 날렸다.
난세(亂世)에 들어 태사자가 처음 모신 주인은 양주자사(揚州刺史) 유요(劉繇)였다. 유요도 태사자의 이름을 들었을 법 했으나 황족(皇族)이라는 후광 때문인지 거들먹거리며 홀대했다. 정찰병 따위의 임무나 맡게 된 태사자였으나 그는 유요를 원망하지 않았다.
한 번 몸담은 곳은 절대 배반 않는 성정은 손책(孫策)과의 피 터지는 일대일 혈투(血鬪)와 그 이후 과정에서 드러난다.
정사삼국지(正史三國志) 등에 의하면 어느 날 태사자는 한 명만 데리고 손책 측 군영(軍營)을 염탐하러 갔다. 원술(袁術)로부터 독립한 손책은 당시 무서운 속도로 강동(江東)을 평정하면서 유요의 영지도 침범한 상태였다.
그런데 태사자는 정말 우연찮게 유요 측 군영을 친히 살피러 온 손책 무리와 마주쳤다. 태사자 측은 단 두 명인 반면 손책은 13명을 이끌고 있었다. 태사자는 달아나는 대신 유요를 위해 죽고자 했다. 다행히 ‘상남자’끼리 알아봤기 때문인지 호승심(好勝心) 때문인지 태사자‧손책은 단 둘이 붙게 됐다. 장창(長槍)‧도검(刀劍)‧수극(手戟) 등으로 상대 목줄기를 노리다가 급기야 상대 무기를 빼앗고 투구를 벗겨내는 등 격렬한 대결이 펼쳐졌다. 양 측 대군이 몰려옴에 따라 두 사람은 끝내 승부를 내지 못하고 말머리 돌렸다.
얼마 간의 전쟁 후 졸장부 유요는 손책에게 패한 뒤 부하들도 내버리고서 197년 예장군(豫章郡)으로 달아났다. 태사자는 포기하지 않고 산월(山越) 등 이민족들까지 모아 대항하다가 손책에게 생포됐다.
손책은 끌려온 태사자의 포박을 풀어주며 물었다. “우리가 용호상박(龍虎相搏) 싸웠던 때를 기억하시오? 만약 그 때 나를 사로잡았다면 그대는 어떻게 했겠소?” 태사자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감히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는 즉 ‘널 죽였을 것이다’는 의미였다.
손책은 벌컥 화내는 대신 호탕하게 껄껄 웃으며 이 당돌한 포로를 중용했다. 이러한 파격적 대우에도 태사자는 진심으로 승복하지 않았다. 그는 유요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에야 손책을 새 주인으로 받들었다. 손책이 빈약한 군세(軍勢)에 곤란해 하자 “유요의 패잔병들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모아오겠다” 약속하고서, 손책 휘하는 입 모아 “태사자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려했지만, 정말로 그 약조를 칼 같이 지키기도 했다.
손책 휘하에 들어간 뒤에도 태사자의 신용은 빛을 발했다. 그의 이름을 들은 조조(曹操)는 미상의 시기에 태사자에게 선물을 보냈다. 태사자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서찰 한 통 없이 한약재인 당귀(當歸)만 들어 있었다. 당귀는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당연히 돌아온다”는 뜻이 된다. 이는 곧 태사자에게 “네 고향 청주를 다스리는 (또는 다스리게 될) 내게로 오라”는 조조의 메시지였다.
밀림‧늪지 투성이인 양주와 달리 중원(中原)은 대도시가 즐비한 명실공히 제국의 중심이었다. 게다가 선물을 보냈을 무렵 조조는 승상(丞相) 즉 사실상의 조정 1인자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태사자의 마음은 태산(泰山)처럼 굳건했다. 그는 206년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앞두고서도 손가(孫家)의 귀신이 될 것을 맹세했다. 태사자의 마지막 말은 “7척 장검(長劍)을 차고 천자(天子)의 계단에 올라야 하거늘 어찌하여 죽는단 말인가”였다. 이는 제 손으로 동오(東吳)‧손가의 천하통일을 이뤄 새 왕조를 개창(開創)하고 자신은 검리상전(劍履上殿)의 영광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 원통하다는 의미였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復黨)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한 그는 제 입으로 이재명 대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다. 이르면 25일 두 사람의 회동이 예상된다.
이 전 의원이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에 복당한다면 당귀 한 줌에 넙죽 엎드리고서 저 혼자 살고자 또 부귀영화(富貴榮華) 누리고자 했던 옛 난신(亂臣)들을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으리라 짐작한다.
신용은 당심(黨心)‧민심(民心)을 받들어야 할 정치인의 최고 덕목 중 하나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아무리 맞은편 집에서 출세해본들 “과연 저 사람이 국민을 위해 헌신할까” 의심받게 된다. 이는 정치불신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당귀를 문 철새 특히 상습 철새는 정계에서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 이 전 의원의 현명한 결단을 바란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email prot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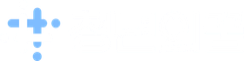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민주당 복당은 평소에 민주당을 부정적이며 냉혹하게 비판한 이언주님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첨언을 하자면 민주당 복당은 평소에 민주당을 부정적이며 냉혹하게 비판한 이언주님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이언주 씨가 참 안타까울 따름이며,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께서도 현명히 잘 가려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짦은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곡을 찌르는 칼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