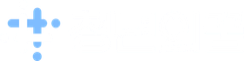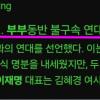|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4·2 재보궐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외국인 참정권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외국인 유권자만 1만2019명에 달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참정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도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약 14만 명이다. 이 중 중국인은 11만35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의 81%에 달한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었다. 약 3년 만에 1만3000여 명이 늘어났는데, 중국인 유권자도 3년 새 9만9969만 명에서 1만3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사실상 중국인 유권자만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초·광역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의무 거주 기간과 관련한 요건도 없다. 이에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투표만 하러 대한민국에 입국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인 유권자의 상당수가 중국인인 만큼 국내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현지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선거법은 '만 18세가 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중국 국적 보유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도 외국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기준을 상향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7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해당국 외국인에게 국내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 상향과 관련한 지적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거주 기준이 짧은 만큼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정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은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중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국인 유권자가 많아지는 추세인 데다 중국인이 밀집한 지역은 이들의 표심을 얻고자 중국에 우호적인 선심성 정책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국내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 의원은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된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는 고 의원이 처음이 아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외국인 선거권 부여 기준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도 거주 기간 상향과 함께 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여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외국인의 참정권 제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2년 12월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 중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상호주의 공직선거법을 발의했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는 11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잃게 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외교에 있어서 상호주의는 중요한 원칙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 두 가지를 지켜내야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킬 수 있다"며 "외국인에 의해 민의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1/20250401003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