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지만 안정된 직업 없이
측량 일이나 목수 일 같은 정직한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 <월든>은
1845년 월든 호숫가의 숲속에 들어가
통나무집을 짓고 밭을 일구면서
소박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2년간에 걸쳐 시도한 산물이랍니다.
처음 출간했을 당시엔 주목을 끌지 못하다
오늘날에 와서야 19세기에 쓰인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지요.
나는 사람의 꽃과 열매를 원한다.
나는 사람에게서 어떤 향기 같은 것이
나에게로 풍겨 오기를 바라며,
우리의 교제가 잘 익은 과일의 풍미를
띠기를 바라는 것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 <월든> 119쪽
작가가 이 책의 상당부분을 집필한 건 월든 호숫가에 홀로 살고 있을 때였는데, 1장은 2년 2개월의 호숫가 생활 이후 다시 문명세계로 돌아와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쓴 것이라 한다. 처음 책을 펼치자마자 문명세계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시선들을 비롯한 따분한 이야기들이 전개된 탓에, 기대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서 집중이 잘 안 되고 재미없게 느껴졌다. 내가 원했던 내용은 호숫가 생활의 유유자적함인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흑
하지만 1800년대에 문명세계에 대해 비판한 내용이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게 흥미롭기도 했다.
“부질없는 근심과 쓸데없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며 삶이 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 “고된 노동 탓에 투박해진, 심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런 섬세한 열매를 딸 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른가 싶어서 씁쓸해졌다.
작가는 이런 도시의 모습, 문명인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의 평가, 즉 스스로의 행
동 탓에 얻은 평판의 노예이자 죄수가 되어 천박하게 굽실거리며 온종일 막연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라 신랄하게 비판한다. 비유가 다양하고 사유에 깊이가 있고 필력 또한 좋아서 점점 읽는 재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식량, 주거, 의복, 연료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외의 것들, 혹은 불필요할 정도로 과도한 것들 (소위 사치품과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여러 물품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다지 필요치도 않을 뿐도 아니라, 인간의 발전에도 방해가 된다고 말한다.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은 소박하고 빈곤한 삶을 살았다며...)
특히 ‘옷’에 대한 것과 ‘집’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나오는데. 옷은 몸을 가리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유행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필요치도 않은 옷을 여러 벌 갖는다는 비판이 인상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이웃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니 나도 하나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장만하기 위해 평생 쓸데없는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간다는 비판 등의 내용은 어쩜 200년 전에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구구절절 다 맞는 소리라서 뜨끔뜨끔 찔리기도 했다.(물론 옷이나 집도 예술적인 측면에서 ‘패션’과 ‘건축’이라는 분야로 단단한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옷’과 ‘집’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신의 철학적인 가치를 부여할까 싶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본주의의 굴레에 여기 저기 끼어 굴러가고 작은 톱니바퀴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월든 같은 한적한 호숫가로의 ‘이탈’밖에 없는 걸까. 1장을 읽으면서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과 추구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당히 잘 적응하기 위해 부리고 있는 사치나 불필요한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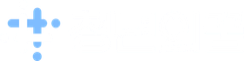






















왜 우리는 쫓기듯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가
놓지 못해서..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