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 소견의 담론
갑질 대신 인성 바로서는 나라 되기를
맹사성(孟思誠‧생몰연도 1360~1438)은 세종(世宗) 대에 재상을 지낸 인물이다. 호(號)는 고불(古佛)로서 조선(朝鮮)을 대표하는 청백리(淸白吏)로 유명하다. 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에도 불구하고 ‘갑질’과는 억만광년 떨어진 소탈한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존경받고 있다.
조선 초의 문필가 성현(成俔)이 지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맹사성과 한 젊은 백면서생(白面書生‧또는 부호)의 ‘공당문답(公堂問答)’이라는 게 나온다.
고향인 충청 온양을 방문하고서 한양으로 돌아가던 맹사성은 큰 비를 만나 경기 용인의 한 주막에 머물게 됐다. 먼저 와 있던 젊은이는 남루한 동네노인 차림의 맹사성이 누군지 모른 채 이른바 ‘야자타임’을 갖자고 제안했다. 맹사성은 말끝마다 ‘~공’을 붙이고 젊은이는 ‘~당’을 붙여 대화하며 놀자는 것이었다. 맹사성은 젊은이의 당돌한 요구를 흔쾌히 수락했다.
먼저 맹사성. “그대는 어딜 가는공?” 젊은이 왈 “한양에 간당” 맹사성 왈 “한양엔 왜 가는공?” 젊은이 왈 “과거(科擧) 보러 맹꼬부리(맹사성) 만나러 간당” 맹사성 왈 “조정에 아는 사람은 있는공?” 젊은이 왈 “없당” 맹사성 왈 “내가 벼슬자리 하나 주면 어떤공?” 젊은이 왈 “(폭소하며) 헛소리 들을 시간 없당”
시간이 흘러 며칠 뒤. 과거에 합격한 젊은이는 동료들과 함께 인사 차 좌의정(左議政)을 예방했다. 엎드려 절한 뒤 고개 든 젊은이는 맹사성을 보자 까무러쳤다. 빙그레 웃은 맹사성은 공당놀이로 말을 걸었다. “자네, 나를 알아보겠는공?” 젊은이 왈 “아, 알아보겠당” 맹사성 왈 “지금 기분이 어떤공?” 젊은이 식은땀 흘리며 “죽.. 죽여주소서이당(또는 죽고싶당)” 그러나 맹사성은 젊은이를 나무라지 않고 큰 인재가 되게끔 전심전력 도왔다고 한다.
또다른 젊은이와의 일화. 맹사성은 휴가 때마다 낙향(落鄕)해 시냇가에 앉아 피라미 낚시를 즐겼다. 어느 날 또다시 폭우가 내려 시냇물이 크게 불었다. 그 때 물을 건너려던 한 젊은 선비는 도포가 젖을까봐 고민했다. 그는 마침 동네영감 차림으로 낚시에 열중하던 맹사성에게 대뜸 “날 업어 달라” 요구했다.
맹사성은 두말없이 젊은이를 업고 냇물을 건넜다. 그런데 맞은편으로 건너간 젊은이는 뭐가 심사가 그리 뒤틀렸던지 버럭버럭 화를 내며 맹사성의 삿갓을 들어 내팽개쳤다. 그러자 지체 높은 고관(高官)들만 쓸 수 있는 옥관자(玉貫子)가 모습을 드러냈다. 갑질 일삼던 젊은이는 까무러치며 “당신 뉘시오?” 물었다. 맹사성은 빙긋 웃으며 “온양 사는 맹꼬불이라네~” 답했다.
이번엔 지방사또와의 일화. 맹사성은 관청에 출퇴근을 하든 어디로 행차를 하든 수행원 없이 검은소(黑牛) 한마리만 타고 다니기로 유명했다. 어느 날 좌의정 대감이 온양에 온다는 첩보 접한 일대 수령들은 잘 보이기 위해 맹사성이 지날 길을 깨끗이 닦고서 기립한 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도착할 시간이 됐음에도 맹사성은 보이지 않고 대신 웬 시골노인 하나가 소를 타고 유유자적 지나갔다.
“일껏 청소한 길이 저 노인네 때문에 더러워졌네” 씩씩거린 사또들은 사람을 보내 맹사성을 잡아왔다. 맹사성은 빙그레 웃으며 “온양 사는 맹꼬불이가 제 소 타고 제 길 가는데 어찌 바쁜 사람 붙드는고?” 한마디 하고선 가던 길 마저 갔다. 눈앞이 아득해진 사또 무리는 사죄하기 위해 급히 쫓아갔는데 그 중 하나가 그만 인수(印綬)를 연못에 빠뜨려 그 못은 인침연(印沈淵)이라 불리게 됐다고 한다.
바야흐로 갑질의 시대다. 그간 종종 ‘짧소’ 등 형태로 썼지만 필자가 수달 전 이사 온 서울 모처도 갑질이 만연하다. 아버지뻘 경비원에게 “똥개”라 욕하고는 적반하장으로 경찰 부르겠다고 당당히 협박하는 걸 듣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퇴근 후 또는 휴일의 마실 차림인 필자에게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몇몇 인간들이 갑질을 했더랬다.
참다못한 필자가 신분 밝히고서 공익차원에서 필봉(筆鋒) 들려 하자 그제야 강약약강(強弱弱強)의 해당 인간들은 근래 보이지 않고 있다. 지층 사무실 앞에 누군가 상습적으로 ‘변’을 보고 갔더라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물으니 갑질 현상이 비교적 줄어들었다고 하더라. 필자는 비단 현 거주지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갑질들을 자주 목격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그리고 만인(萬人)은 평등하다. 남에게 갑질할 권리 가진 사람 없고 남에게 업신여김 당해야 할 사람도 없다. 무엇보다 인성(人性)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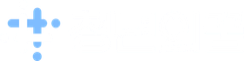












참 빼먹었습니다만 약팔이+몰카+성범죄+깽값+잡새용돈주기 보편화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