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치를 난전(亂廛)으로 만드는 장사치들
韓 국민이 원하는 건 불법난전 아닌 제갈량
‘인간학 교과서’에 드러난 교훈
중상모략(中傷謀略)이 갖는 위력은 불행히도 크다. 현대 선전‧선동술을 확립한 나치독일 선전장관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는, 발언 진위여부는 설왕설래가 오가지만,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 할 땐 사람들은 이미 선동돼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역사상 많은 요설가(妖說家)들은 가벼운 혀를 놀려 정적(政敵)을 제거코자 했다. 중상모략의 화살은 “적은 먼 데 있지 않다”는 말처럼 적진이 아닌 ‘내부’의 능력자에게로 더 많이 향하곤 했다. 괴벨스가 “대중(大衆)은 작은 거짓말보단 큰 거짓말에 속는다”고 한 것처럼 중상모략의 수위는 여느 막장드라마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낮지 않았다.
인간학(人間學)의 교과서와도 같은 삼국지(三國志)에는 중상모략 앞에 스러져가거나, 또는 이를 극복한 영웅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기에, 삼국지 등장인물들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대는 물론 교훈도 제시하고 있다.
봉기와 전풍
전풍(田豊‧생몰연도 ?~200)은 후한(後漢)의 대장군‧태위(太尉)였던 원소(袁紹) 휘하 참모였다. 조조(曹操)가 허수아비 황제 헌제(獻帝)를 차지하려 하자 “우리가 먼저 천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간언할 정도로 식견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한나라가 비록 쇠락했다곤 해도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서 한제(漢帝)는 여전히 충성해야 할 천하의 주인이었다. 이러한 천자(天子‧황제)를 옆구리에 끼게 되면 황제의 이름을 빌어 제후들을 호령할 수 있게 된다. 황명(皇命)을 받들지 않는 이는 경쟁제후는 물론 휘하 백성들로부터도 “역적”이라는 거센 반발을 사게 된다.
200년 발발한 관도대전(官渡大戰)에서 조조에게 대패한 원소에게는 실은 승리의 기회가 있었다. 유비(劉備)가 조조 수하였던 서주(徐州)자사 차주(車胄)를 공격해 서주 상당수를 점령하자 조조는 토벌에 나섰다. 서주백성들은 앞서 조조에 의해 대학살을 겪은 터라 유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상태였다. 때문에 조조는 전력(全力)을 들어 서주를 칠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조조 근거지는 텅 빈 상황이나 마찬가지였다. 전풍은 이 기회에 허도(許都)를 덮쳐 천자를 구하자고 제안했다. 앓아누운 어린 자식 때문에 망설인 원소에 의해 허도습격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역사에 만약(if)은 없다곤 하지만, 만약 이 때 원소가 결단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알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뛰어난 식견에 비례해 전풍은 동료참모들로부터 시기‧질투 대상이 됐다. 말을 둘러서 하지 못하고 곧바로 표현하는 강직함도 이것의 원인이 됐다. 관도대전이 발발하자 전풍은 계책을 내놨지만 도리어 원소의 노여움을 사 투옥(投獄)됐다. 원소는 군량창고를 습격한 조조의 일격필살(一擊必殺)에 박살났다.
평소 전풍을 존경하던 옥리(獄吏) 등은 “주공(主公‧원소)께서 선생 말씀이 옳았다는 걸 알고 중히 쓰실 것”이라며 축하를 건넸다. 하지만 전풍은 “주공은 겉으론 군자(君子)인 척하지만 실은 의심이 많다. 이겼다면 의기양양하게 나를 사면했겠지만 패했으니 나를 더욱 미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차 전풍을 헐뜯으면서 원가(袁家)에 아첨하던 봉기(逢紀) 등은 “전풍은 우리가 패했다는 소식에 손뼉 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고 참언(讒言)했다. 당초 “전풍 얼굴 보기 부끄럽다”던 원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전후사정도 알아보지 않은 채 전풍을 옥중처형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괴감에 시달리던 원소는 202년 선혈을 토하며 병사(病死)했다. 주군의 사후(死後) 이번엔 원소의 말자(末子) 원상(袁尙)에게 빌붙어 골육상쟁(骨肉相爭)을 부추기던 봉기는 원소의 장남 원담(袁譚)에 의해 한 칼에 참수됐다.
곽도와 장합
장합(張郃‧?~231)은 원소의 상장(上將)이었다. 원소는 전풍과 마찬가지로 장합의 조언도 물리치기 일쑤였다.
관도대전 당시 장합은 한 갈래 경기(輕騎)를 보내 조조의 후방을 들이친다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위풍당당한 겉모습과 달리 내심 조조를 두려워하던 원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머잖아 조조는 원소의 후방 군량창고를 강습(強襲)해 원소군의 자멸(自滅)을 이끌어냈다.
원소는 불타오르는 곡창(穀倉)을 목격하자 그제야 뻔뻔하게도 장합을 보내 조조의 진영(陣營)을 덮치도록 했다. 장합은 “조조 측 군영(軍營)은 이미 방비돼 있을 것입니다. 조속히 곡창을 구하는 게 상책(上策)입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원소는 이번에도 기각했다. 장합이 내다본 대로 조조 진영을 덮친 원소군은 함정에 걸려들어 참패하고 말았다. 일설에는 조조가 십면매복(十面埋伏)의 덫을 쳐놨다고도 한다.
봉기와 마찬가지로 아부능력만 출중했던 참모 곽도(郭圖)는 원소의 조조 안방급습 계획에 박수친 터였다. 비록 급습안은 원소가 제일 먼저 내놓은 것이었지만, 속 좁은 원소가 실패 책임을 측근에게 덮어씌울 가능성은 충분했다. 이에 곽도는 “장합은 우리의 패배에 기뻐하면서 불손(不遜)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고 거짓으로 고했다.
이번에도 원소는 변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한 채 화부터 버럭 냈다. 무의미한 죽음을 직감한 장합은 동료 고람(高覧)과 함께 조조에게 귀순하고서 원소 측 망루(望樓)를 불태워버렸다. 조조의 집안아우 조홍(曹洪)은 장합을 경계했지만 조조는 장합을 중용하고서 천자에게 상주(上奏)해 도정후(都亭侯)에 봉했다.
장합은 조조의 손자 조예(曹叡) 때까지 살면서 제갈량(諸葛亮)의 북벌(北伐) 등에서 활약했다. 유비는 조조의 대장 하후연(夏侯淵)을 참살하자 “응당 우두머리(장합)를 잡아야지 이런 걸 뭣에 쓰나”라며 혀를 찰 정도로 장합을 최대위협으로 여겼다. 제갈량은 위연(魏延) 등 상장 여럿과 수만 군사를 동원한 매복전(埋伏戰) 끝에 장합을 겨우 제거할 수 있었다.
종회와 등애
등애(鄧艾‧197?~264)는 조위(曹魏)의 대촉(對蜀) 방면 야전사령관이었다. 편모슬하(偏母膝下)로 자라나면서 어려서 송아지를 치는 목동, 전농부민(典農部民‧둔전민) 등으로 생계를 꾸렸던 그는 삼국시대 당시 자수성가(自手成家)의 표본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위나라의 둔전(屯田)제도는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유랑민에게 일정 땅을 떼어주고 대신 살인적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등애는 미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주경야독(晝耕夜讀)해 출사(出仕)했다. 출세직과는 거리가 먼 농업 등 잡과(雜科) 계열 문관으로 활동한 그는 특유의 유능함으로 주(州)의 요직(要職)에 올랐다. 사마의(司馬懿)와 인연을 맺은 것도 이 시절이었다. 사마의도 조씨(曹氏)일가 등의 참언에 평생 시달리던 인물이었다.
문관으로서 공적(功績)을 쌓던 등애는 제갈량의 군략(軍略)적 후계자 강유(姜維)가 북벌에 착수하자 무관으로 전향했다. 고대~중세에는 고려의 강감찬(姜邯贊) 장군처럼 문무겸직(文武兼職)이 일반적이었다. 등애는 강유의 북벌을 모조리 격퇴할 정도로 용병(用兵)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사마의의 차남이자 위나라의 권신(權臣) 사마소(司馬昭)는 방어일변도에서 벗어나 263년 촉한(蜀漢)정벌에 나섰다. 등애는 종회(鍾會) 등과 함께 야전사령관이 됐다. 등애는 정공법(正攻法)으로는 한중(漢中) 일대의 검각(劍閣) 등 관문을 죽었다 깨어나도 통과할 수 없다 여겼다. 이미 이순(耳順)의 고령이었던 그는 승부수를 던졌다. 바로 깎아지른 듯 험준한 진령(秦嶺)산맥을 넘어 입촉(入蜀)한다는 계획이었다.
구글 등에서 ‘진령산맥’ 등으로 검색해보면 나오듯, 이 산맥은 잔도(棧道)가 있지 않은 한 도저히 사람이 걸어서 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괜히 이태백(李太白)이 촉도난(蜀道難)에서 “촉 땅으로 가는 길은 푸른하늘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읊은 게 아니었다.
관문·잔도는 촉군(蜀軍)이 철통 같이 방어하고 있기에 등애의 입촉과정은 목숨 건 사투(死鬪)의 연속이었다. 완전무장하고 기어오른 절벽 낭떠러지 너머에선 이불 등을 둘둘 감은 채 말 그대로 굴러 떨어졌다. 이것을 수십 차례 반복했으니 사지(四肢)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있을 리 만무했다. 병장기가 부러지고 사상자가 급증함은 물론 사기도 바닥을 쳐 전속(田續) 등 탈영병들이 속출했다. 부상자가 발생한다 해도 그 첩첩산중에서 본대로 후송(後送)시키는 건 불가능했다.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위병(魏兵)들 앞을 기다린 건 강유관(江油關), 즉 그렇게 피해가고자 했던 관문에 주둔하면서 잘 먹고 푹 쉬던 수천의 촉군이었다. 제풀에 겁먹은 수문장(守門將) 마막(馬邈)이 재깍 투항하지 않았더라면, 강유관은 등애와 그 수하들 무덤이 됐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야말로 천우신조(天佑神助)로 촉한의 수도 성도(成都) 코앞까지 이른 등애는 자포자기한 촉 후주(後主) 유선(劉禪)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
고금(古今)에 보기 드문 업적을 세운 등애는 간신들의 공적(公敵)이 됐다. 그와의 입촉경쟁에서 패한 종회는 “등애가 모반(謀反)하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러나 정작 역심(逆心)을 품은 건 종회 그 자신이었다. 낙양(洛陽)으로 호송되던 중 종회의 반란‧사망으로 인해 무고함이 입증된 등애는 풀려나는 듯 했지만, 끝내 간신배들은 그를 용납하지 못한 채 월권(越權)까지 감수하면서 등애를 암살했다.
이엄과 제갈량
앞선 세 개의 사례와 달리 참소(讒訴)를 슬기롭게 물리친 인물도 있다. 바로 촉한의 승상(丞相) 제갈량(184~234)이다.
선주(先主) 유비의 입촉 이후 촉 땅의 파벌(派閥)은, 태곳적부터 이곳에 살던 원주민은 제외할 때, 마치 오늘날의 대만처럼 크게 세 개로 분류됐다. 삼국시대보다 약 200년 앞선 인물인 공손술(公孫述) 등을 따라 들어온 세력, 유비에 앞서 촉 땅을 다스린 유장(劉璋)을 섬기던 세력, 그리고 제갈량‧장비(張飛)‧조운(趙雲)‧간옹(簡雍)‧미축(麋竺) 등 유비를 좇는 세력이 그것이다.
이엄(李嚴‧?~234)은 유장을 받들다가 유비에게 항복한 세력의 수장(首長)격이었다. 세 파벌의 갈등은 용인술(用人術)의 달인 유비 시절엔 적어도 표면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비라는 구심점이 사라지자 상호견제는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구(舊) 유장파의 최대 숙청목표는 단연 제갈량이었다.
이엄은 유비 시절 상서령(尚書令) 등을 역임하면서 중용됐다. 임종을 앞둔 유비는 제갈량 등과 함께 어린 새 천자를 보좌할 고명대신(顧命大臣)으로 이엄을 지명했다. 이엄은 유선 시절에도 전장군(前將軍)‧가절(假節)‧광록훈(光祿勳)‧도향후(都鄉侯) 등 제갈량 못지않은 높은 벼슬을 얻었다. 제갈량은 승상‧가절‧녹상서사(錄尙書事)‧무향후(武鄕侯) 등이었다.
북벌에 나선 제갈량이 외지(外地)에 주로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엄은 조정에 상주(常住)하면서 천자를 보필했다. 이엄은 수 개 군(郡)을 떼어 새 행정구역을 만든 뒤 자신을 자사(刺史)로 삼아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제갈량에게 마치 조조처럼 구석(九錫)을 받아 왕위에 오르라고 부추기는 등 수상쩍은 행보를 일삼았다.
주(周)나라 때부터 천자가 큰 공로의 신하에게 내린 아홉 가지 물건을 뜻하는 구석은 후한 시기에는 찬탈(簒奪)의 의미로 변질돼 있었다. 한나라 건국자인 고조(高祖) 유방(劉邦)은 “유씨(劉氏)가 아닌 자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율법(律法)을 공포한 적 있었기에, 왕위 등극도 마찬가지로 반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였다. 이엄은 곧 제갈량을 뜨거운 화롯불 위에 앉게 해 ‘역적 타이틀’을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한 셈이었다.
이엄의 폭주는 제갈량의 후기 북벌 때 절정을 이뤘다. 사마의‧장합 등을 무찌른 제갈량이 바야흐로 고도(古都) 장안(長安)으로 진격해 한나라 강산을 수복할 바로 그 찰나, 본국(本國)으로부터의 군량보급이 돌연 중단됐다. 제갈량은 결국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뒤로 하고 회군(回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보급책임자였던 이엄은 이상한 표문(表文)을 황제에게 올렸다. “군량이 충분한데도 승상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엄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수하 잠술(岑述)을 죽여 입을 막으려하기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이엄이 정말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不可抗力)적 이유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정략(政略)적 이유로 일부러 보급을 끊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바로 ‘군권(軍權)을 장악한 제갈량이 양곡(糧穀)이 충분함에도 회군하는 건 다름 아닌 황위(皇位)찬탈이 목적이다’ 등의 모양새를 만들기 위함 아니었냐는 분석이다. 어리석은 후주 유선이 이를 믿는 순간 제갈량의 입지는 위태롭게 된다.
제갈량은 손 놓고서 후주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다리거나 반대로 군사를 몰아 입성(入城)하는 대신 슬기롭게 대처했다.
제갈량은 표문을 올려 이엄이 그간 했던 무리한 요구나 부추김을 낱낱이 폭로했다. 또 “(조위 등) 도적들이 소멸되지 않고 사직(社稷)이 위태로운데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는 오직 모두가 화합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엄)을 포용해 대사를 망쳐선 안 됩니다”라고 준엄히 꾸짖었다. 기록엔 명확하지 않지만 촉군은 둔 채 홀로 입궁(入宮)함으로써 혹 있을지 모를 후주의 의심도 풀었을 가능성이 높다.
제갈량‧이엄 사이에 과거 오갔던 편지 공개, 잠술 등의 증언으로 인해 이엄의 음모실체는 드러났다. 한 때 흔들렸던 후주는 분노해 이엄을 폐서인(廢庶人)하고 유폐했다. 안방을 든든히 한 제갈량은 북벌을 재개했으며, 이엄은 추풍오장원(秋風五丈原) 때까지 두 번 다시 복직하지 못하다가 쓸쓸히 병사했다.
애당심(愛黨心)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두고 여권 내 일부세력의 중상모략‧인신(人身)공격 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최근 유튜브에 오른 홍 시장의 서울 여의도 기자회견 관련 영상에는 “홍준표가 압수수색 받더니 쫄았다” 등 주장이 올랐다. 여의도 정가(政街)에서 홍 시장 관련 정체불명 소문이 떠돈 건 이미 오래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헌정사(憲政史)에서 집안갈등은 존재해왔다. 하지만 근래의 행태는 마치 괴벨스의 극단주의처럼 이미 정상범주를 넘어선 상태다. 이렇듯 내란(內亂)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과연 애당심(愛黨心)이라는 게 있기나 한지 궁금할 정도다. 남들 신나게 헐뜯고 이간질시키면서 그저 몇 년 간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주워 먹다가 세상 바뀌면 박쥐처럼, 철새처럼, 봉기‧곽도‧종회‧이엄처럼 새 둥지로 옮겨가려는 심보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이건 정당인(政黨人)이 아닌 장사꾼일 따름이다. 국가지대사는 결코 장사의 논리로 좌지우지될 수 없다. 장사는 주고받음의 거래 개념이지만 정치는 그 이상의 이상(理想)이 기저(基底)에 있어야 한다.
바라건대, 대한민국 정치가 조속히 자정(自淨)되길 바란다. 선전‧선동, 세 치 혓바닥을 밑천으로 하는 장사꾼들은 조속히 정계에서 퇴출되길 바란다. 이들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현혹된 자 있다면 하루빨리 미몽(迷夢)에서 깨어나길 촉구한다. 홍준표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ㅈ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email prot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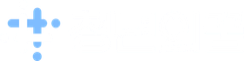






















일하는 사람을 당파싸움으로 평가하려하니 왜곡이 발생하지 나쁜놈들
잘 읽었습니다.
홍준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력과 역사의식 그리고 청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홍준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력과 역사의식 그리고 청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모든 청꿈 식구님들께 맞는 옳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청꿈 식구님들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되는건 좌우의 저들은 서로는 싸워도 한마음으로는 준표형님을 어떻게든 내쫓으려는 심보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걸 비밀리에 이행하고 있는것 같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있어선 아니될 일입니다.
역으로 생각할 때 그만큼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라고 조심스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당파싸움으로 평가하려하니 왜곡이 발생하지 나쁜놈들
일부 무능력자들의 당무농단, 사당화 시도는 있어선 안 될 줄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