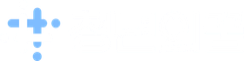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65699?sid=110

법무부가 14일 있을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 공개 변론을 앞두고 사형제 유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 사형이 정의에 합치된다는 자세를 견지한 것이다. 합당한 의견으로 보인다.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동일한 흐름이다. 여론도 사형제 유지 쪽에 무게가 기운다. 지난해 9월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사형제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
사형제 위헌 여부 판단은 희망 고문에 가깝다. 헌재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건 1996,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으로는 그른 판결의 위험성을 없애자는 논리에 수긍이 간다. 우리 역사의 그늘에 사법 살인이 있었던 탓이다. 흠결 없는 판결에 의문이 있은 터였다. 희생자들의 명예가 뒤늦게 회복됐어도 생의 부활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사상범으로 사형수 신분인 이들이 없다. 엉뚱한 사형수를 양산할 만큼 사법 시스템이 허술한 것도 아니다.
사형제 폐지가 민주화의 척도도 아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해 세계 84개국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형 판결은 상징으로 남은 지 오래다. 오히려 흉악범의 사형을 집행하라는 목소리는 꾸준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지 20년이 넘었다. 그러자 국회도 움직였다. 2020년에는 홍준표 의원 등이 사형 확정 흉악범을 6개월 내에 사형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생명을 유희의 목적으로 유린한 이들이 생명 존엄권 적용의 대상이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유족은 평생 잔인한 기억에 휩싸여 산다. 기억을 강하게 재연하는 계제는 엄연히 살아 있는 가해자들이다. 그들이 살아 있는 시간 동안 유예된 정의 실현을 매일 깨우치는 것이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어떤 위로도 없다. 국가가 합법의 영역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유영철, 강호순 등 사형수 59명의 손에 숨진 이들만 200명이 넘는다. 혈세를 들여 먹이고 자연사하도록 두는 건 유족에게 또다른 고문이다. 게다가 교도소 내에서 사형수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 현실이 이러니 태형과 장형을 합리적 형벌로 인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참에 사형 집행의 오랜 유예도 재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