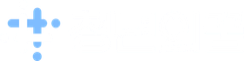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 소견의 담론
대한민국에도 희생적 리더 나타나주길
현장(玄奘‧생몰연도 서기 602~664)은 당(唐)나라의 승려이자 탐험가‧번역가다. 속명(俗名)은 진위(陳褘)이며 흔히 현장법사‧당삼장(唐三藏) 등으로 불린다. 한중일 모두에서 사랑받는 소설 서유기(西遊記)의 주인공 삼장법사의 모티브로도 유명하다.
구당서(舊唐書) 등에 의하면 현장은 10살이 될 무렵 낙양(洛陽)의 정토사(淨土寺)에 들어갔다. 13세 무렵 승적(僧籍)에 이름을 올려 현장이라는 법명(法名)을 얻었다. 이후 장안(長安)‧성도(成都) 등 대륙 전역을 돌며 불교를 연구했다. 끝내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던 그는 627년 또는 629년 무렵 부처의 나라 천축(天竺‧인도)으로 혈혈단신 떠났다.
걷고 또 걷고 하염없이 걷는 여행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승려라 가진 재산이 없을뿐더러 개인 신분으로 떠난 터라 국가지원도 바랄 수 없었다. 게다가 도처에서는 도적떼가 목숨을 노렸다. 기록에는 명확치 않으나 한창 혈기왕성할 나이인 청년승려의 금욕(禁慾)을 깨려는 시도도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장은 630년 무렵 가까스로 도착한 고창국(高昌國)에서 국왕 국문태(麴文泰)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고창국은 토하라인(Tocharian) 즉 백인이 세운 국가였다. 한동안 머물며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등 불법(佛法)을 설파한 현장이 떠나려 하자 국문태는 네 명의 수행원을 붙여줬다. 이들 네 명은 서유기에서 손오공(孫悟空) 등으로 각색됐다.
쿠차(庫車)‧투르판(吐鲁番) 등 서역의 여러 나라를 거친 현장은 북인도의 바르다나(Vardhana)에 비로소 도착했다. 인도 불교 중심지 날란다(Nalanda)사원의 주지 계현(戒賢‧시라바드라) 밑에서 수학한 현장은 남은 의문을 남김없이 풀기 위해 인도 전역을 돌며 연구를 거듭했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현장은 수많은 경전(經典)을 짊어진 채 출국 십수년 만인 641년 귀로(歸路)에 올랐다. 떠날 때 헌헌장부였던 현장은 어느덧 불혹(不惑)에 가까운 중년이 돼 있었다. 귀국길에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국문태를 다시 만나려 했으나 고창국은 이미 당나라에 의해 멸망한 뒤였다.
힌두쿠시(Hindukusch)산맥과 파미르(Pamir)고원을 넘고 넘은 현장은 당태종(唐太宗) 등 조야(朝野)의 환영 속에 645년께 장안에 입성했다. 태종은 현장에게 환속(還俗) 후 조정에서 일할 것을 권했으나 현장은 사양했다. 현장은 반야심경(般若心經) 등을 한역(漢譯)하는 한편 서역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를 저술했다. 신라(新羅)의 고승(高僧)인 원측(圓測)이 현장의 제자였다고 한다.
불기(佛紀) 2568년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5월15일)이 다가왔다. 연등회(燃燈會) 행렬은 11일 전국 각지에서 실시됐다고 한다. 약 1400년 전 현장이 제 한 몸의 고행을 감수함으로써 오늘날 수많은 중생(衆生)은 깨우침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에도 향후 현장 같은 리더가 출현함으로써 도탄에 빠진 국민을 아비규환(阿鼻叫喚)에서 구해주길 염원한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