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전쟁 등 ‘이승만 죽이기’ 맞서는 작품들
이젠 우리 건국‧산업화 역사 바로 직시할 때
조선 4대 국왕 세종대왕(世宗大王‧생몰연도 1397~1450)은 두말할 것 없는 한민족 최고의 성군(聖君)이다.
한글 창제 등 내치(內治)에서 무수한 업적을 이룬 그가 사실은 정복군주이기도 했다는 점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여진족(女眞族)이 격퇴되고 두만강~압록강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한반도 국경이 확립된 게 세종 때다. 그런데 세종이 전쟁통에 ‘몽진(蒙塵‧임금이 난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함)’ 비슷한 ‘온천행’을 감행했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알려져 있지 않다.
세종 15년(1433년), 세종은 평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 최윤덕(崔閏德)에게 평안도의 1만여 마보정군(馬步正軍) 및 군마(軍馬) 5천필 등을 주고 북벌을 명했다. 최윤덕은 동년 4월10일 군사를 일곱 갈래로 나눠 여진 부락을 기습적으로 들이쳤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조선은 압록강 유역을 개척하고 4군(郡)을 설치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여진 대추장 이만주(李滿住)는 명(明)나라 관직을 등에 업고 세력을 규합해 다시 조선 변경을 침공했다. 세종은 우선 명나라에 “간섭 말라” 통보한 뒤 세종 19년(1437년)에 약 8000천 병마(兵馬)를 동원해 이만주를 공격했다.
이만주는 2차 침공에서의 조선 측 목표가 1차 토벌 때와는 달리 ‘초토화’임을 알고 결사항전(決死抗戰)했다. 그러나 조선군은 끝내 압록강을 넘어 이만주 부락을 불태우고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게 철저히 짓뭉갰다.
그런데 세종실록(世宗實錄) 등에 의하면 전쟁 발발 직전인 1433년 3월25일 세종은 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려는 장졸들을 독려하고 치중(輜重) 마련에 고생하는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수도 한성부(漢城府‧한양)에 머무는 대신 ‘온정(溫井‧충남 온양온천)행’에 나섰다. 그것도 왕실 전체가 이동하는 초호화 여행이었다.
오늘날의 정의 코스프레이어들이 보면 탄핵한다 뭐 한다, 세종이 비선실세에게 휘둘리고 있다 어쩐다, 외국에 천문학적 비자금 숨겨 놨다 카더라 길길이 날뛸 일이었다. 당대에도 반대 여론이 일었다. 박흔(朴昕)이라는 사람은 상소를 올려 “지금 거병(擧兵)해 야인(野人)을 정벌하려 하는데 온천에 행차하시어 도읍을 비우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주장했다. 사헌부(司憲府)도 “한 달이나 도읍을 비우는 건 실로 염려되는 일입니다. 적어도 세자(世子)만이라도 도성에 남아 군심(軍心)을 다잡고 나라를 감독해야 합니다” 아뢰었다.
그러나 세종은 “따를 수 없다” 한 마디로 물리쳤다. 그리고는 정말로 왕실 일가친척들과 함께 온양온천으로 향해 한 달씩이나 머물며 씻고 먹고 마셨다. 세종의 환궁(還宮)은 전쟁이 다 끝나기 직전인 4월20일에야 이뤄졌다. 평안감사(平安監司) 이숙치(李叔畤)는 세종의 환궁 이틀 뒤에 이순몽(李順蒙)의 승전보를, 3일 뒤에 최윤덕 등의 승전보를 조정에 올렸다.
‘성군’ 세종의 온천행을 두고 지금은 물론 당대에도 갖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김종서(金宗瑞) 등은 세종이 나들이에 나섰다는 소문을 퍼뜨림으로서 여진족이 방심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무장한 여진 남성이 1만 명만 모여도 대륙을 정복한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여진족은 최강의 전투민족이었다. 여러 부락이 유목‧농경을 각각 행했기에 여진족은 유목민족의 전투력과 농경민족의 생산력‧행정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만주에는 질 좋은 철광석이 풍부했다. 실제로 여진족은 1115년에 이미 거대한 금(金)나라를 건국한 적이 있었고 1616년에는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청(淸)나라를 세우게 된다.
때문에 세종으로선 토벌군을 보냈긴 보냈으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다. 도리어 역격(逆擊)당해 한성부까지 여진족이 밀고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 달이나 이어진 세종의 온천행을 두고 여진족을 방심시키는 동시에 유사시를 대비해 ‘사전 몽진’을 했다고 해석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다.
그렇다면 ‘백성도 버리고 군사도 버렸던’ 세종은 비난받아야 마땅할까. 결론은 아니다.
위로는 영의정(領議政)부터 아래로는 말단병사까지 누구든 전시(戰時)에 군무이탈을 해선 안 된다. 이는 처형감이다. 그러나 국정(國政) 최고컨트롤은 다르다. 최고컨트롤은 말 그대로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결정권자다.
이 결정권자가 만용(蠻勇) 또는 쓸데없는 인정에 이끌려 도성에 남아 있다가 적군에게 목숨 잃으면 나라는 결정권자를 잃게 된다. 전쟁을 언제까지 진행하고 언제 어떤 형태로 끝낼지, 외국과의 외교는 어떻게 할지, 문무백관들 인사(人事)는 어떻게 할지, 백성 피난 및 구휼(救恤)은 어떻게 할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 여진족이 대추장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히 움직이며 우리 강산을 파괴하는 사이에 조선은 조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우왕좌왕하게 된다. 패전을 넘어 식민지가 될 가능성까지 염려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성에 여진족이 난입함에 따라 각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바쁜 난리통에 평시처럼 새 임금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기도 어렵다. 새 리더를 중심으로 여진족에 맞서기는커녕 어떤 지역에서는 왕족 A를, 어떤 지역에서는 왕족 B를 옹립해 적전내전(敵前內戰)이라는 꼴사나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세종 한 사람이 사라짐으로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시나리오다. 따라서 세종의 온천행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1875~1965) 전 대통령의 6‧25 몽진을 두고 예나 지금이나 말이 많다. 그러나 상술한 대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에 남아 북한 인민군에 해를 입거나 북한 포로가 됐다면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었을 게 분명하다. 난리통에 유권자 모두가 참여하는 조기 대선 치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가능성이 100%에 수렴한다.
이 전 대통령이 살아서 초인적 정신력으로 민군정(民軍政)을 지휘하고 한미동맹을 이끌어냈기에 지금의 한민족 역사상 최고 국력의 대한민국도 있을 수 있다. 안 그랬다면 지금쯤 우리 사회는 집집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초상화가 걸려 있고 길거리에는 완장 찬 견딸부대와 굶어 죽은 시신들이 굴러 다녔을 터였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은 “시민 여러분 서울은 안전합니다. 남아 계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결단코 없다. 한강다리를 끊은 것도 일각에서 문제 삼기는 허나 그렇다고 한강다리를 남겨놨다간 인민군 남진(南進)을 재촉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 전 대통령이 절도(絶道)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떠나 대통령은 소수를 희생하더라도 다수를 지켜야 하는 고독한 자리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은 철교 끊고서 “안전하다”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다. 마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제 손으로 사지(死地)에 몰아넣었던 덩케르크(Dunkerque)의 수십만 영국군을 끝내 구조했듯 머잖아 서울을 수복(收復)하고 시민들을 구출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배부른 독재자’였다는 비판도 있으나 일제(日帝)에서 배불린 지주(地主)들 논밭을 거둬 일반 농민들에게 나눠준 게 바로 이 전 대통령이었다. 허위사실 동원해 이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이들도 그가 부정축재(不正蓄財)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 욕심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4‧19가 발발하자 발포(發砲)를 명하는 대신 미련 없이 하야(下野)했다.
이 전 대통령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최근 개봉했다. 또 다른 이승만 다큐 ‘기적의 시작’도 이달 말 전국에서 상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건국‧산업화 역사는 그간 너무도 일방적으로 일부의 입맛에 맞게 각색‧매도되어왔다. 늦은 대로 이제는 ‘진실’과 마주할 때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 [email prot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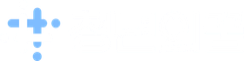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처럼 너무 심하게 왜곡되어 비난받는 정치 지도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이승민 대통령 공과를 따질 때 공은 9요 과는 1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